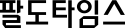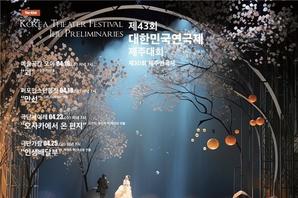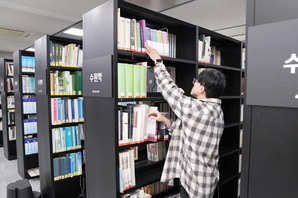독락당(獨樂堂)은 조선의 성리학자 회재 이언적(李彦迪, 1491~1553)선생이 홀로 사유하며 학문을 탐구하며 즐겼던 건축과 자연의 공간이다. 자계 천을 따라 700m 거리의 옥산서원은 동방오현(東方五賢)의 학자 회재 선생을 배향하는, 그의 학문을 숭상하고 따르는 후학들이 사후에 건립한 서원이다.
서원에서 동쪽 12km 떨어진 양동마을의 외가 서백당(書栢堂)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사유와 삶의 건축 공간 독락당과 양동마을은 2010년(한국의 역사마을)에, 옥산서원은 2019년(한국의 서원)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 독락당, 홀로 사유를 즐기는 집
회재가 사림파의 정쟁으로 관직에서 축출되고서 분노와 좌절, 회한과 자성, 도약을 위한 시간과 공간은 이곳 독락당이었다. 그리하여 선가 도가 학문의 원숙한 사상가로 거듭나며 조선의 성리학자로 추앙을 받는다.
자연과 함께 은거하며 생활의 이상을 실천하는 ‘독락’은 중국 사마광의 ‘독락원기(獨樂園記)’에서 기인한다. 23세 과거에 급제하며 경주부윤 관직에 오른다. 25세에 소실(양주 석씨)을 들이면서 경주 안강읍 옥산리에 은거 생활의 별업(別業) 독락당을 짓게 된다. 안채 사랑채 행랑채 규모를 갖춘 건축은 몇 차례 여느 사대부 집보다 규모가 크다.
태어나서 자라고 정실부인이 있는 양동마을과 집을 두고 일찍이 별업을 경영하며 스스로 ‘독락’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명문 외가(월성 손씨)에 대한 콤플렉스라 말하기도 한다.
1532년 40세에 관직에서 박탈 낙향, 독락당에서 은거하며 자연과 도가의 정신세계, 사색과 학업에 집중하게 된다. 주변 자연에 묻힌 듯 조화를 이루고 있는 독락당은 낮은 자세로 안팎을 폐쇄하고자 하는 은둔의 건축이다. 솟을대문을 들어서면 행랑채가 마당을 막아선다. 바깥마당을 지나 다시 작고 좁은 대문간을 들어서면, 집 안 방향은 여러 갈래로 동선이 나누어지며 손님을 반기지 않는 동선이다.
안채, 사랑채와 계정, 그리고 오른편 좁은 골목길은 자계 계곡의 미로처럼 분리된다. 특히 사랑채 독락당의 낮은 기단과 낮은 집 높이는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고 낮추고자 한다. 본체 방향에는 맛배지붕, 반대편에 팔작지붕은 권위와 격식을 떠나서 해학으로 보아 넘겨야 할까? 담장과 해우소 살창 사이로 외부 자연을 바라보게 하는 시선교감은 분명 뛰어난 공간 방법론이다.

사랑채에서 다시 안마당으로 진입하여 또다시 만나는 계정(溪亭)은 세상에 없는 독락당 건축의 백미(白眉)이다. 자연으로 열린 집이며 정자이자 내·외부 경계이다. 퇴계 글씨 현판의 ‘양진암(養眞庵)’은 우정을 나누었던 절친 정혜사 주지 스님이 절집처럼 묵었다는 사랑채요 게스트하우스이다. 한석봉 글씨 현판 ‘계정’은 계곡 자연과의 유기적 마루공간이다. 집 모퉁이 작은 공간에서 4계절 자연을 바라보며 홀로 즐기는 폴리(Polly)이며 정자이며 소우주 공간이다. 계정의 참모습은 바깥 개울 건너에서 바라보면 온전히 드러난다. 담장 띠 창살, 바위 생김새에 따라 필로티 기둥 위 허공에 떠 있는 공간의 멋이 한눈에 들어온다.
이 무렵(1528)에 양산보가 낙향하며 지은 담양의 원림 소쇄원을 떠올려 보면 광풍각 제월당에는 많은 묵객이 거쳐 가며 글과 그림을 남긴 열린 공간이었다. 독락당에는 회재의 자연과 건축 공간들만이 남아있다. 독락당에서 옥산서원에 이르는 계곡의 바위(5대), 주변의 산(4산)에는 스스로 불교적 도교적 이름들을 지어서 자신의 우주관으로 삼았다. 후일, 여기의 자연경관들의 영역을 확대 ‘옥산구곡’으로 불리고 있다.
절치부심의 독락당 7년 후, 경상도 관찰사로 관직에 복귀하나 을사사화 정쟁에 휩쓸려 강계로 유배를 떠난다. 6년 후 1553년 유배지에서 죽음을 맞는다. 서자 이전인은 회재 곁에서 나눈 학문적 대화록 ‘관서문답록’을 발간하며 독락당을 지켰다.
◆ 옥산서원, 자연 속에서 폐쇄의 건축 공간

회재 이언적 사후 20년이 지난 1572년 옥산서원이 건립된다. 서원은 성리학자를 배향하고 그의 학문을 숭상하고 따르는 후학들이 건립하는 지방의 사립학교이다. 성균관은 한양의 국립대학이며 향교는 각 지역의 관학이었다. 사후에 건립된 서원은 회재의 의지와는 무관하지만, 삶의 배경과 학문 사상과 건축의 의미를 연관하여 보게 된다. 영남지역에 유서 깊은 서원이 많은 것은 유교문화 선비정신이 유달랐던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의 614개 서원 중 경상도에 3분의1이 넘는 221개소가 있었고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 이후에 남은 47개 중 영남지역에 14개로 가장 많았다. 서원은 크게 강학 공간, 제향 공간, 유식(遊息) 공간으로 배치하는데 제향 비중을 크게 두거나 유식이 생략되며 배치는 다르지만 기본 유학 위계질서는 벗어나지 않는다.
옥산서원은 자옥산 골짜기의 자계 계곡에 자리하여 작은 폭포, 남쪽 계류를 잇는 외나무다리를 건너는 낭만적 운치가 있다. 그러나 옥산서원은 독락당처럼 내부 지향적 폐쇄적인 건축 철학을 담고 있다. 역락문(외문)을 거치는 무변루는 자연을 향해 열린 누마루 건축이 아니다. 통로를 두고는 방들로 채워진다. 안마당에 들어서면 강당, 기숙사(동 서재), 무변루 지붕 처마가 거의 붙어서 외부로 향하는 시선들은 막혀있다.
구인당 정면은 벽으로 막히고, 창문은 모두 내부 마루를 향해 있다. 입면은 폐쇄적이며 무창 불통의 건축이다. 서로 건물만 마주 보고 학습에만 집중하는 듯, 정신적 휴식의 유식 공간이 없다. 숲의 풍경과 자연의 소리를 차단하고 있는 폐쇄적 건축이다. 장경각(도서실) 장판각(출판)이 있으며 서원의 크기로 학생 수와 경제 규모를 짐작케 한다. 관리사(서원청)의 규모는 원만한 서원보다도 큰 것은 부자 양동마을의 배경이기도 할 것이다.
◆ 양동마을

독락당과 옥산서원에서 동쪽 12㎞ 거리의 양동마을은 월성 손씨 명문가 종가마을이다. 물(勿)자 산지형으로 일컫는 독특한 마을지형은 능성줄기로 뻗어있다. 지체가 높은 양반 집은 높은 산등성에 위치하고 신분이 낮은 집은 마을 아래에 있다. 외부 방문객들은 높은 윗마을을 다 돌아보기가 힘들어서 대부분 아랫마을에서 되돌아 나오게 된다.
마을에는 회재와 관련한 3건축이 있다. 회재는 위쪽 마루 외갓집 서백당(書栢堂)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경상도 관찰사 시절(53세) 무첨당을 지었고 후일, 동생과 노모를 위한 집 ‘향단’을 짓는다. 용(用)자 평면과 3개 지붕이 시그니처로 나타나는 ‘향단’은 마치 서양 바로크 건축처럼 한옥 관행을 초월한 집이다.
손씨 토박이 마을에 들어선 이씨의 집 위치에 따라 두 가문의 위세를 말하기도 한다. 지금도 후손들은 월성 손씨, 여강 이씨의 선의적 문벌 경쟁을 ‘손이시비(孫李是非)’라 표현하고, 회재의 서자 이전인의 상속 연고 다툼은 ‘적서시비(嫡庶是非)’라는 말로 전해지고 있다.
후대에 길이 남아있는 성리학의 업적 성과들을 인문학이라 일컫는다면 회재 이언적의 삶과 사상이 배어 있는 건축과 공간들은 인문적 장소이다. 그는 홀로 사유하며 학문과 삶을 즐긴 낭만적 건축주요 창의적 건축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