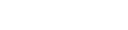주요기사
(대전일보) 충청권 생활·경제권 묶을 광역도로망 구축… 국가계획 반영 촉각
충청권 메가시티 실현과 도시 균형발전을 목표로 추진 중인 광역도로망 구축사업들이 연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전시는 올 8월 대전-충북을 잇는 '와동-신탄진동' 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검토하는 한편, 12월 교통혼잡도로 대상 국가계획 반영 여부가 나올 것으로 전망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미래 교통량 대처와 도시 경쟁력 강화 등 필요성은 담보했지만, 관건은 경제성 확보다. 사업성을 기준으로 각 사업이 후순위로 밀리거나 추진동력을 잃을 수 있어서다. 29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과 세종, 충남, 충북 일원에 총 연장 36.5㎞ 규모로 7개 노선 도로개설이 추진되고 있다. 총 사업비는 1조 2744억 원이다. 시는 이 중 '와동-신탄진동'과 '대덕특구-금남면' 등 2개 광역도로의 경우, 국토교통부에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2026-2030)의 수정계획 반영을 요청한 상태다. 앞서 두 노선 모두 2021년 제4차 국가계획에 반영됐지만, 시행계획 마지막 해인 올해까지 예타 통과 등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착수하지 못했다. 보다 시급하거나 경제성이 높은 타 도로개설 사업을 우선순위로 두면서, 두 노선은 사업 검토·보완 기간을 더 거쳤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이르면 내달 국토부에 '와동-신탄진동' 구간의 예타 신청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자체 심의를 거쳐 연말 기획재정부 예타 신청 여부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노선은 대전과 충북을 잇는 7.4㎞ 연장 왕복 4차로 노선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총사업비 1531억 원이 추산된다. '대덕특구-금남면'(8.7㎞) 도로개설사업은 세종시 금남면에서 대전 유성구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연결하는 왕복 4차로 규모다. 추산 사업비는 3599억 원이다. 4개 혼잡도로 역시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계획(2026-2030)이라는 국가계획에 반영돼야 첫 발을 뗄 수 있는 구조다. 도심 내부 교통량 분산과 교통혼잡비용 감소를 위해 추진, 국가 전반적인 균형발전 차원에서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해 국토부에 '갑천 좌안도로'(4.3㎞)와 '유성대로-화산교'(3.1㎞), '비래동-와동'(5.7㎞), '산성동-대사동'(2.8㎞) 등 4개 혼잡도로의 국가계획 반영을 건의, 반영 결과는 올 12월 예상된다. 추산 사업비는 각각 1109억 원, 1560억 원, 2417억 원, 1678억 원 등이다. 국가지원지방도인 '현도교-신구교' 구간은 행정절차상 가장 앞서고 있지만, 다소 난항을 겪고 있다. 제5차 국도·국지도건설 5개년계획(2021-2025)에 반영, 2020년 기재부 예타까지 통과했으나 사업 구간 내 하천구역이 저촉돼 있어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가 길어지는 탓이다. 시와 금강청 간 협의가 쉽게 마무리되지 않아, 2022년 8월부터 시작된 실시설계 용역도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며 장기화되는 중이다. 우선 시는 금강청과의 조율을 서두르겠다는 목표다. 대덕구 신탄진동에서 문평동 구간을 우회하는 국지도 '현도교-신구교' 개설사업은 총사업비 850억 원을 투입해 4.5㎞ 길이 왕복 4차선 도로를 신설하는 게 주 내용이다. 시 관계자는 "광역도로망 구축으로 대전·세종·충남·충북 지역 간 이동시간을 단축해 주거·일자리·문화 통합 생활권을 조성한다면 실질적인 광역경제권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또 국가 간선도로망 완성도를 높이고 정주여건을 향상시키면서 지방 인구유입 확대 또한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