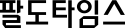![제주국제공항 남북활주로 끝에서 진행된 유해발굴 현장 모습 [박근태 일영문화유산연구원장 제공]](http://www.lpk.kr/data/photos/20250414/art_17435539019381_7102f5.jpg)
군·경 토벌대에 암매장된 4·3희생자들은 과거 유족들이 시신을 수습했다.
1992년 보안당국은 4·3의 참상을 덮기 위해 다랑쉬굴 희생자 11명의 시신을 화장한 후 바다에 뿌렸다.
이처럼 4·3희생자 유해는 양지바른 곳에 묻히지 못하면서 구천을 떠도는 신세가 됐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종민)이 2006년부터 시작한 4·3행방불명 희생자 유해발굴은 4·3사업의 최대 성과로 꼽힌다.

1일 제주4·3평화재단에 따르면 그동안 419구의 유해를 발굴, 147명(35%)의 신원을 확인했다.
특히, 4·3당시 ‘사형장’으로 불렸던 최대 학살터였던 제주공항에서 2007~2009년 3년간 유해발굴을 실시해 암매장된 387구의 유해를 찾아냈고, 유전자 감식으로 92구(23.8%)의 신원을 확인했다.
정부의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북부(제주읍·조천면·애월면) 예비검속자 500여 중 200여 명은 1950년 8월 19~20일 이틀간 제주공항으로 끌려갔고, 여기서 집단 학살된 후 암매장됐다.
당시 부역에 참여했던 이들은 “군 트럭에 사람들이 실려 와서 계속 총살됐는데 피 냄새가 역겨워 구덩이에 들어 갈 수 없었다”고 증언했다. 공항 근처에 살았던 주민들은 “마파람이 불면 썩는 냄새가 진동했다”고 회고했다.
정작, 공항에서 나온 유해는 대정읍 섯알오름 희생자와 서귀포 3면(서귀·중문·남원면) 희생자로 밝혀졌다.
공항 유해발굴에 참여한 박근태 일영문화유산연구원장은 “남북활주로 끝단에서 군사재판 희생자(2007년), 서귀포 3면 희생자(2008년)가 긴 구덩이에서 차례대로 나왔지만, 북부예비검속자는 단 한 구도 나오지 않았다”며 “이를 볼 때 남북활주로 속에 희생자들이 암매장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표 투과 레이더를 사용했지만 큰 돌덩어리가 5m 높이로 매립돼 있어서 유해 흔적은 나오지 않았다”며 “남북활주로를 일시 폐쇄한 후 발굴작업을 해야 유골 수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제주북부예비검속 희생자 유족들은 매년 합동 위령제에서 “무고한 희생에 이어 땅속에서 나오지 못한 영령들의 피맺힌 절규가 지금도 들리고 있다”며 구천을 떠도는 넋을 위로하기 위해 조속한 유해 발굴을 호소했다.
![제주4.3 당시 많은 양민들이 집단 총살 당한 후 암매장된 가운데 제주4.3평화재단이 긴 구덩이에서 유해를 수습한 모습. [박근태 일영문화유산연구원장 제공]](http://www.lpk.kr/data/photos/20250414/art_17435539023722_d1a284.jpg)
4·3평화재단은 2023년 10월 대전형무소 수감자들이 집단 총살된 대전 골령골에서 4·3당시 행방불명된 고(故) 김한홍씨(1923년생)의 유골을 확인했다. 이는 1000여 구의 수습된 유골 중 200여 구를 선별해 유전자 대조 감식을 벌인 결과였다.
또한 지난해는 10월에는 옛 광주형무소 터에서 4·3행방불명 희생자인 고(故) 양천종씨(1898년생) 유해를 찾아냈다.
양정심 4·3평화재단 조사연구실장은 “4·3당시 전국 15개 형무소에 2530명의 도민들이 수감됐고, 한국전쟁 이후 행방불명됐다”며 “국가 공권력에 희생된 4·3행방불명인 유해 발굴과 유전자 검사를 도와 재단에서 하기보다는 국가 차원의 지원과 전문인력이 투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4·3유족들은 채혈을 통해 유전자 자료가 있는 만큼, 신원 확인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공항 4.3희생자 집단 암매장지에서 발견된 희생자들의 도장과 안경. [박근태 일영문화유산연구원장 제공]](http://www.lpk.kr/data/photos/20250414/art_17435539033435_e425b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