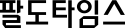파리(Paris), 혼자 속삭이듯 되뇌면 아주 친근하게 잔잔한 파동으로 울려 퍼지는 도시의 이름이 있다. 내겐 파리가 그렇다. 몬테 크리스토 백작, 장 발장, 쌩텍쥐베리를 지나 녹음 테이프에 담긴 에디트 피아프의 사랑의 찬가, 까뜨린느 드뇌브의 쉘브르의 우산, 1980년대 해적판으로 본 이케다 리요코의 창작만화 베르사유의 장미, 영화 퐁네프의 연인들, 김은숙의 드라마 파리의 연인, 오드리 토투의 아멜리에, 그뿐인가, 저 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수많은 화가들, 그렇게 파리의 모든 것이 내 젊은 날의 한 축(軸)이었던 까닭이다.
별로 친하진 않았지만 늘 나를 꿰뚫듯 보던 한 친구가 말했다. 어른이 되면 넌 파리의 어느 골목을 걷고 있을 거 같아. 그때 그 말이 각인되었던 걸까. 성년이 되고도 한참 지난 어느 해 가을 나는 파리에서 한동안 체류하게 되었다. 물론 업무상 간 것이었지만 '파리의 어느 골목을 걷고 있을' 것 같다던 그 말에 채무감 비슷한 게 있던 나는 여름휴가도 쓰지 않고 모아서 최대한 파리에서의 시간을 길게 잡았다. 그해 가을 나는 '파리에서의 한 철'을 시인 랭보인 양 미(美)를 무릎에 앉혀 축제처럼 보냈다.

◆파리에서의 한 철
우선 도심 리옹역 근처 호텔을 정한 뒤 도시 지하철 노선부터 외웠다. 역시 방사상으로 구획된 도시라 지하철만 갈아타면 목적지 어디라도 갈 수 있는 편리한 구조였다. 지하철역에서 오렌지색 1개월 교통권을 사고 루브르미술관 지하로 가 파리 뮤지엄패스(Carte Musee)를 샀다. 1주일 동안 파리 대부분의 미술관과 박물관을 이용할 수 있는 티켓이었다. 그러나 루브르의 쉴리관, 드농관, 리슐리외관 225개 전시실, 40만 점의 작품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보는 것만으로 오전 업무를 본 후 1주일을 내내 다녀야 했다.
스핑크스와 밀로의 비너스, 사모트라케의 승리의 여신(니케), 레오나르드 다빈치의 모나리자, 미켈란젤로의 반항하는 노예들, 함무라비법전 등 고고학 유물과 그리스도교 전래 이후의 서양문명, 중세, 르네상스, 근대와 극동지역 예술품의 향연은 내게 만화경(萬華鏡) 그 자체였다.
들라크루아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제리코의 메두사의 뗏목, 앵그로의 그랑드 오달리스크 또는 렘브란트나 베르메르 그림 앞을 나는 하염없이 서성거리기도 했다. 다비드의 나폴레옹황제 대관식은 몇 번이나 다시 보러 갔고, 루벤스의 거대한 마리 드 메디시스 일대기 그림들을 올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쉬기도 했다.
가끔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지 않고 파리의 골목을 걷기도 했다. 어느 날은 튈르리궁 정원 의자에 앉아 연못의 잔물결을 구경하거나 루아얄궁전 회랑 기둥에 기대어 서 있기도 했다. 휴일에는 오페라 가르니에 바깥 계단에서 버스킹을 보다가 관광객 무리에 섞여 들어가 천정을 올려다보며 그 화려함에 감탄하기도 했고, 파리의 수호성녀 막달라 마리아를 생각하며 마들렌성당을 지났고 어느 오후엔 콩코르드광장을 가로질러 다시 루브르로 가기도 했다.

◆프랑스 영화처럼
잡지 화보에서 걸어 나온 듯 멋진 차림의 여자가 담배를 피며 걸어가는 것을 본 날 나는 거의 충동적으로 영화 아멜리에의 촬영지를 찾아 몽마르트르로 갔다. 낡은 아르누보양식이 추레해 보이는 아베쎄역에 내려 건너편 선로를 바라봤을 땐 울컥 집으로 돌아가고 싶단 생각이 들었다. 영화 속 즉석사진 부스는 없었지만 지하철역 벽의 반을 차지한 커다란 삼성 광고판 때문이었는지 긴 계단 끝에서 바이얼린 연주를 하던 거리의 악사 때문이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문득 그랬다.
떼르트르광장의 수많은 무명화가들과 그림을 보다 귀퉁이에서 발견한 다소 기괴한 형태의 살바도르 달리미술관을 둘러보고 사크레쾨르성당으로 올라갔다. 수많은 사람들의 발길로 반질거리는 포도(鋪道)엔 낙엽이 뒹굴고 있었다.
영화 포스터 속 은빛 스푼을 들고 크렘 브륄레의 바닐라 껍질을 깨려는 아멜리에가 니노의 잃어버린 사진첩을 전해주던 공원이 성당 아래 경사지게 펼쳐져 있었다. 어디선가 아련하게 들려오는 아이들 함성, 아, 영화 속 그 회전목마다. 그래, 이것이 파리의 낭만이구나.
사크레쾨르 첨탑에서 파리 시내를 내려다보고 지하로 내려가 잘려진 자신의 목을 든 생 드니의 입상도 본 뒤 아멜리에가 일하던 두 개의 풍차 카페(Café des deux Moulin)로 갔다. 피카소와 고흐도 이 길을 걸어 다녔을 생각을 하며 잠시 그들이 모여 살았다던 선술집 세탁선(Bateau Lavoir)으로 갈까 망설이다가 결국 아멜리에의 카페로 향했다. 영화와 별반 다를 게 없는 카페에서 뜨내기 객으로 관자를 곁들인 샐러드와 와인 한 잔을 마시고 지하철역으로 걸어오니 물랭루즈(Moulin Rouge) 네온이 프랑스영화의 한 장면처럼 반짝 켜진다.

◆오르세미술관
1849년부터 1차세계대전 직전 1913년까지의 작품으로 채워진 오르세미술관에서 나는 축제의 절정 같은 느낌에 휩싸여 역시 며칠을 드나들었다. 사실 나는 그때 울고 싶었다. 전후기 인상주의, 아카데미즘 회화, 조각, 사진, 그래픽 아트, 가구, 공예품 등 19세기 예술작품들 모두 교과서나 도판 등에서만 접한 것들이어서 실제 보고 있다는 다소 촌스럽고 벅찬 감동 때문이었다. 뮤지엄 패스를 매주 새로 구입한 건 물론이다.
파리 대부분의 미술관은 특히 그 유서가 깊은데 가령 루브르는 베르사유궁을 지어 옮기기 전 루이 14세의 궁전이었고, 오르세는 1871년 파리 코뮌 당시 화재로 불타버린 궁전을 만국박람회를 위해 만든 철도역이었다는 식이다. 그래서 루브르가 궁전의 웅장과 화려가 있다면 오르세는 근현대식 철골구조로 높은 천정과 창이 만든 실용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북역과 동역과 다르게 오르세의 5층 테라스와 시계탑 안쪽에서 바라보는 전망과 풍경은 그래서 일품으로 꼽힌다.

고흐와 고갱, 세잔 그리고 퐁타방파와 나비파, 바르비종파의 작품들, 앵그르, 쇠라, 시나크, 쿠르베, 모네, 드가, 르누아르, 마네, 카유보트, 도미에, 모로, 밀레, 사반느, 로트렉, 바자유, 제롬, 보나르, 뷔야르, 부르델, 로댕, 클로델… 5층까지 나는 작품들을 보고 또 보며 오르내렸다. 퐁피두 현대미술관, 오랑주리미술관, 앵발리드 군사박물관, 로댕미술관, 들라크루아미술관, 기메 동양박물관, 부르델미술관, 피카소미술관, 빅토르 위고박물관 그리고 크고 작은 갤러리까지 다니면서도 몇 번이나 다시 오르세로 가곤 했다.

파리에서 한 철을 보내며 나는 운 좋게도 프랑스 초유의 논란을 일으킨 베르사유궁의 제프 쿤스 전시도 볼 수 있었고, 지금은 불타버린 노트르담성당에서 한나절을 보낼 수도 있었다. 그림을 보다 다리가 아프면 들어가 마신 오르세 5층 캄파나카페의 꼬냑이 든 에스프레소 한 잔과 초콜릿, 친구들과 함께 간 파리의 맛집들, 소르본느대학 앞 미야코, 샹젤리제 뒷골목의 홍합집 레옹, 몽빠르나스의 허름한 쿠스쿠스집, 모두 잊히지 않는다.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파리에 가면 몽마르트르의 오 라팽 아질(Au Lapin Agile, 재빠른 토끼)'에 들러 고흐나 위트릴로처럼 녹색 압생트도 한 잔 마실 것이다. 그리고 다시 보들레르의 묘지에 휜 꽃도 한 송이 놓으러 갈 것이다.

박미영(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