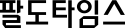광범위한 마약 확산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특히 탈북민이 마약 유혹으로부터 무방비 상태에 놓인 것으로 나타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최근 탈북민이 스스로 마약 투약 사실을 경찰에 알린 사건(7월4일자 인터넷 단독보도)이 대표적인 사례로, 정착 과정에서 고립감을 해소하고 마약범죄 심각성을 깨닫게 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앞서 지난달 25일 오전 9시33분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주택에서 30대 탈북민 여성 A씨가 마약을 투약했다고 경찰(112)에 자수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마약 간이 검사를 진행한 결과 A씨에게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A씨가 마약을 구하게 된 경로를 조사하고 있다.
한국에서 필로폰으로 불리는 메스암페타민은 북한에선 ‘빙두(冰毒, 얼음독)’, ‘얼음’이라고 불린다. 필로폰 제형이 얼음처럼 투명하다는 특징에서 따온 말로 북한에서 메스암페타민을 특정하는 단어가 있을 정도로 북한 일반 주민들 사이에서도 마약은 공공연한 존재다.
윤흥희 남서울대 국제대학원 글로벌중독재활상담학과 교수는 “아플 때 약을 구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북한 주민들은 감기 증세에도 필로폰을 찾는 경우가 많다”며 “필로폰을 기초의약품 대용으로 복용한 탓에 북한을 이탈한 뒤에도 마약 투약에 거부감이 적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마약 관련 범죄는 전체 탈북민 범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이근무 HA연구소장·유숙경 전남대 정책대학원 강사의 ‘북한 이탈주민의 마약 중독 경험연구’ 논문에 따르면 지난 2021년 8월 기준 교정시설 내 탈북민 174명 중 60명이 마약류 범죄로 수감돼 있었다. 전체의 34%에 달하는 수치다.
통일부의 ‘연간 북한이탈주민 입국 인원 현황’을 보면, 북한이탈주민 입국 인원은 지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1천명대를 기록했다. 2020년 코로나19가 유행해 북중 국경이 통제되면서 국내 입국 인원이 급감했지만, 2022년 입국자 수가 반등하면서 지난해까지 꾸준히 회복세를 보였다.

이처럼 국내 정착 탈북민 수가 점차 늘어나는 데다 마약범죄 자체도 증가세가 뚜렷해 탈북민 마약범죄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문가들은 탈북민의 마약 문제를 개인의 일탈이 아닌, 정착 지원 시스템 차원에서 다뤄야 할 과제라고 짚었다.
북한의 약물 오·사용 환경이 만연한 만큼 한국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마약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정착 후 고립되는 상황을 막아야 미연에 탈북민 마약범죄를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내 한 경찰 관계자는 “탈북민 상당수가 북한에서 이미 마약을 치료 수단처럼 사용한 경험이 있고, 한국에 오기 전 제3국에 체류하는 과정에서도 마약에 중독될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 정착 후 사회적 고립이나 우울감으로 인해 과거의 경험을 반복하는 경우도 있어 예방과 치유를 위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약 범죄 전문가인 박진실 법무법인 진실 대표변호사는 “사회에서 고립된 탈북민들은 부정적인 시선과 낙인을 우려해 특히 재활에 나서기 꺼린다”며 “마약은 혼자서는 끊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회적 유대가 필요한 만큼, 이들이 한국 사회에 무사히 뿌리내려 재활 시스템을 접할 때까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