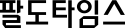유심 정보를 해킹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상 교체를 대응책으로 발표하고 고객들에게 ‘온라인 유심 변경 예약 신청’을 안내하고 있지만, 신청 사이트 UX(사용자 경험) 디자인이 부실해 디지털 취약자인 노인들에게 큰 장벽이 되고 있다.
‘인증번호 입력 시간이 초과됐습니다. 다시 확인해주세요.’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유출 사태 이후 29일 창원시 마산합포노인복지관에서 만난 이모(77)씨는 온라인 유심 변경 예약 신청을 5분여간의 씨름 끝에 본인인증 단계에서 포기했다. 이씨는 특히 자신의 정보를 어디에다가 적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했다. 이 과정에서 보안문자 입력 시간이 초과됐고 결국 두 손을 놓았다.

SK텔레콤의 유심 교체 신청 중 첫 단계인 ‘본인인증’은 이름, 주민등록번호, 보안문자, 휴대전화 번호, 개인정보 수집 동의 등을 작성하거나 체크해야 한다.
이씨는 이 과정 중 총 3개 구간에서 막혔다. 처음은 주민등록번호 입력란이다. 해당 난은 ‘주민번호 앞 7자리- ○○○○○○’라 설명돼 있다. 이씨는 “여기다 적는 건가”라 중얼거리며 ‘○○○○○○’ 칸을 누른 후 주민번호 앞 7자리를 적었다. 48년생인 이씨는 입으로도 주민번호를 읊었지만 화면에는 첫 숫자인 4만 입력돼 ‘4○○○○○○’라 적혀 있었다.
다음 난관은 보안문자 6자리를 입력하는 난이었다. 이씨는 어지럽게 쓰인 숫자를 간신히 읽고 적었다. 틀리지 않았지만 아래쪽에 입력 시간이 초과됐다는 빨간 글씨가 나타났다. 앞선 절차에서 시간이 많이 소비됐기 때문이다. 보안문자를 다시 입력하기 위해선 오른쪽에 있는 새로고침 기호를 눌러야 하지만 이 과정을 설명하는 문구는 어디에도 없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란 체크는 다음 절차로 넘어가기 위한 마지막 난관이었다. 동의한다는 해당 문구를 손으로 눌러야 하지만, 별도 설명 없이 연한 회색으로 된 체크 표시만 있어 어떤 의도인지 단박에 파악하기 어려워했다. 이외에도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옮겨 적는 과정도 어려워했다.
이날 복지관에서 만난 노인들은 공통되게 스마트폰을 통한 유심 교체 신청이 어렵다고 말했다.
김두영(79)씨는 “혼자 하니 신청 내용도 모르겠고 보안문자 이미지도 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평소 스마트 기기에 능숙해 복지관에서 다른 사람의 유심 교체 신청을 도와줬다는 이갑용(77)씨는 “온라인으로 신청한 사람 중 도움 없이 직접 해낸 사람은 얼마 없다. 다들 링크로 접속하는 법도 모르는데 보안문자가 뭔지 어떻게 알겠냐”고 했다.
이러한 디자인 설계는 UX(사용자 경험) 디자인의 영역이다. UX란 각종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하는 데 있어 쉽게 느끼도록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UX 디자인 전문가인 박희운 경남대 웹툰·디자인학과 교수는 “SK텔레콤의 온라인 유심 변경 예약 신청 사이트는 디지털 취약층을 고려하지 못한 잘못된 설계”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주민등록번호를 적는 난도 앞자리 6자리를 친 후 자동으로 다음 칸으로 넘어가지 않고 설명도 부족해 불편을 느낄 요소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 글자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 버튼을 두고, 누락된 정보가 있을 경우 팝업창을 띄워 알려주는 게 전 연령이 이용하는 UX의 기본인데 해당 사이트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해킹 사태에 민감한 어르신들이 앞으로 더 많이 이용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글자 크기를 키우고 안내 문구가 상세히 명시된 취약층을 위한 사이트도 만들어 운영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