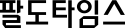“어떤 게 진짜 돌일까요?” 울퉁불퉁하고 제멋대로 생긴 돌멩이가 여럿 있다. 가까이서 살펴보니 매끈한 플라스틱이 돌멩이의 일부처럼 곳곳에 붙어있다.
생김새가 특이한 돌멩이를 전시실로 옮겨둔 듯하지만, 이 오브제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관람객에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이야기하려는 듯 보인다. 생태예술가 장한나 작가의 작품 ‘뉴락’들이 그렇다.
뉴락은 풍화와 침식 등을 거쳐 돌멩이가 된 플라스틱을 뜻하는 장한나 작가만의 독자적인 개념이다. 장한나 작가는 국내 해변에서 10여년째 뉴락을 모으고 있다. 그가 뉴락을 통해 보여주는 건 자연과 하나 될 수 없었던 플라스틱이 생태의 일부가 된 아이러니다.
최근 용인 백남준아트센터에서 장한나 작가를 만났다. 그는 백남준아트센터 ‘랜덤 액세스 프로젝트 4.0’전에서 뉴락을 선보이고 있다. 오는 24일부터는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젊은 모색 2025’전에서도 관람객들을 만난다.
꽤 오랜 기간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져온 장한나 작가의 뉴락은 예술은 난해하거나 어려운 장르라는 편견을 깬다. 작품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간결하고 이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오브제인만큼 남녀노소 사랑을 받고 있다.
강화도에서 나고 자란 장한나는 흙과 가까운 사람이었다. 어린 시절 논밭에서 자란 그는 흙을 만지고, 사계절을 느끼며 그 과정에서 자연스레 생태 감수성을 키웠다. 그랬던 그의 감각이 문제의식으로 바뀐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다. 지난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했던 때다.
“비가 왔는데 우산이 없었어요. 건물 사이 20m를 뛰어가야 했는데 ‘이 비를 맞아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순간 너무 무서웠어요. 환경문제라는 게 늘 잊고 지내던 일인데, 그때는 정말 일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장한나는 그날 이후 ‘원전’과 ‘에너지’ 문제에 깊이 빠져들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작업을 하는 행위 자체가 사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환경문제의 본질은 속도와 양이에요. 우리는 너무 많이, 빨리 소비하고 있어요. 작업을 하는 것도 결국 생산이죠. 그게 회의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던 중 우연히 참여한 제로웨이스트 카페 보틀팩토리의 쓰레기 여행은 예술가 장한나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놓는다. 지난 2017년 그가 참여한 쓰레기 여행은 버려진 플라스틱의 행방을 추적해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프로젝트였다.
“쓰레기가 재활용된다고 해도 결국에는 소각되거나 산더미에 묻히더라고요. 심지어 재활용을 제대로 하는 것조차 어려울 정도로 양이 엄청났어요.”
쓰레기가 재활용되더라도 문제는 끝나지 않는다. 플라스틱은 시멘트 공장에서 연료로 쓰이기도 한다. 그러나 플라스틱을 소각한 뒤 남은 재는 토양과 지하수, 바다로 흘러간다. 자연의 순환고리 속 일부가 돼 언젠가 다시 인간에게 돌아온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알리기 위해 탄생한 게 ‘뉴락’이다.

쓰레기 여행을 하던 장한나 작가는 이 낯설고 기이한 돌을 국내 한 해안에서 처음 발견했다. “하얀 돌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서 보니 플라스틱이 돌처럼 굳어진 거였죠. 그 순간 소름이 끼치고 불편했습니다.”
그날 이후 장한나 작가는 바닷가를 갈 때마다 돌이 된 플라스틱을 마주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뉴락을 하나둘씩 모으게 된 것이다. 돌처럼 변한 플라스틱은 가볍고 특유의 묘한 냄새를 풍긴다. 투명하게 변한 플라스틱이 돌의 틈 사이를 비집고 나오거나 천연석과는 감촉이 다를 때도 있다. 돌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플라스틱이며 자연의 일부가 돼버린 인공물. 뉴락은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일종의 새로운 지질인 셈이다.
장한나 작가는 뉴락을 통해 ‘우리도 모르는 사이 자연의 일부가 돼버린 인공물’의 위험성을 알린다. 장한나 작가는 “뉴락과 같은 것들이 인간에게 언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며 “쉽고 직관적인 작품을 통해 더 많은 사람에게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전하려 한다”고 말했다.
장한나 작가의 작품 뉴락은 무심코 지나쳐온 일상을 들여다보게 한다. 그는 거창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다. 그저 존재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뿐이다. 장한나 작가는 이렇게 말한다. “뉴락은 이 시대의 거울 같아요. 인간이 얼마나 많은 것을 만들고, 버리고, 또 다시 마주하게 되는지를 보여주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