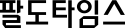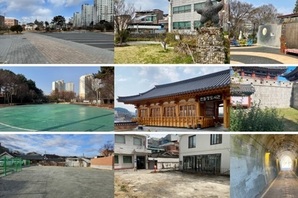광주 도심 곳곳에 설치된 광고와 장식 조명이 밝기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등 빛공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의 수면 장애를 초래하고 동·식물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만큼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디어파사드와 대형 스크린 등 심야 관광자원도 고려해야 한다는 절충안도 제기된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2024년 광주시 제4차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결과 5648개 측정 지점 가운데 3807개 지점이 허용기준을 웃돌아 전체 초과율이 67.4%에 달했다.
이번 평가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른 것이다. 광주시는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하고 결과를 정부에 보고하고 있다.
시가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표준지 281곳(5648개 지점)을 지정해 빛공해 환경영향 측정·조사를 진행했다.
표준지에는 3차 빛공해 환경영향 평가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한 지점 212곳(75%)에 신규 개발행위 허가가 이뤄졌거나 용도지역 변경이 있었던 지역 59곳을 추가했다.
빛공해 민원 발생 지역, 옥외 체육시설, 생태보호지역, 공원, 지자체의 요구지, 미디어파사드 설치 지역이 포함됐다. 조사 유형은 공간조명(가로등·보안등·공원등·옥외조명 등), 광고조명, 장식조명(미디어파사드 등 )이다.
평가결과 640개 공간조명 중 38%(246개), 4916개의 광고조명 중 71%(3479개), 88개 장식조명 중 89%(78개)가 빛 방사허용기준을 초과했다.
공간조명 중 기준 초과는 보안등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총 568개 보안등의 40.0%인 227개가 빛방사허용기준을 넘어섰다.
가로등은 33개 중 13개가 기준을 초과해 초과율 39.4%를 보였으며, 공원등은 6개 중 4개가 기준을 초과했다. 옥외조명 24개 중 2개만이 초과했다.
광고조명 측정 기준치를 초과한 조명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채널레터형(글자 마다 등이 켜지는 조명)으로 2307곳 중 1689곳이 초과했다.
행정구역별 분석 결과 광산구가 2083곳 중 68.5%(1426곳)로 초과율이 가장 높았다. 첨단지구와 수완지구 내 상권 지역의 조명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다행히 빛공해 민원 발생은 감소세이다. 2021년 426건 달하던 빛공해 민원이 2022년 311건으로 줄었고 2023년 266건으로 감소했다.
2023년 빛공해 민원은 주로 공간조명에 대한 수면 방해 및 생활 불편과 관련된 내용이었으며, 특히 자치구 중 가장 면적이 넓은 광산구(156건)에서 공간조명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았다. 광산구의 대부분 자연녹지지역(1종)으로 지정돼 있어 농작물 피해와 관련된 민원이 대부분이었다.
노후 건축물(30년 이상) 연면적 비율이 29%대로 가장 높은 동구의 경우 도로의 폭이 좁고 건물이 밀집돼 있어 보안등으로부터 방사된 침입광에 의한 빛공해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적인 공간조명의 초과율은 전년도에 비해 개선되었으나, 초과한 지점의 경우 빛방사허용기준의 약 3.1배에 달하는 수치를 보여 공간조명에 인접한 주거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고조명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았던 서구의 경우 자치구 중 가장 면적이 작지만, 광주시의 주요 거주 및 상권 지역으로 옥외광고물이 2번째로 가장 많은 지역이고 광고조명의 초과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평가에서 실제 광주교·사직공원·광주시 미디어아트플랫폼·금남공원·광주 톨케이트를 조사한 결과 금남공원만 제외하고 나머지 4곳은 모두 기준치를 초과했다.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빛공해는 수면에 문제를 일으켜 인체에도 호르몬 문제를 일으키고 생태계 동·식물 번식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면서 “미디어파사드 등에 관한 빛공해의 경우 다양한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통한 절충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