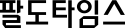청평사(淸平寺)는 춘천의 문화유산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이다. 고려, 조선 그리고 근현대에 이르는 동안 선조들이 남긴 다양한 역사의 흔적들이 남아 있다. 그중에는 일본의 다도보다 앞서 차 생활을 실천한 대표적 차인(茶人)인 고려시대 중기 학자 이자현(李資玄·1061~1125년)이 남겨 놓은 흔적도 포함돼 있다. 이자현은 1087년부터 37년 동안 청평사에 머물면서 문수원(文殊院) 고려정원을 만든 인물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자현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차 문화와 관련 있는 유적이 '진락공 세수터'라는 그릇된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고려 중기 학자인 이자현 벼슬 버리고 은거한 춘천 청평사
계곡서 발견된 찻물터…문수원기 뒷면 '음명다' 표현 불구
후대 조선 선비들의 기록 바탕 '진락공 세수터' 잘못 명명
대한불교조계종 제3교구 본사인 설악산 신흥사(新興寺)의 말사인 청평사는 973년(고려 광종 24년) 영현선사(永賢禪師)가 창건해 백암선원(白岩禪院)이라 불렀다.
그 뒤 폐사됐다가 1068년(문종 22년) 이의가 중건하고 보현원(普賢院)이라 했다. 1089년(선종 6년) 이의의 아들인 이자현(李資玄)이 벼슬을 버리고 이곳에 은거했다. 청빈한 삶을 산 진락공 이자현은 산 이름을 청평(淸平)이라 하고 절 이름을 문수원(文殊院)이라 한 뒤 견성암(見性庵)·양신암(養神庵)·칠성암(七星庵)·등운암(騰雲庵)·복희암(福禧庵)·지장암(地藏庵)·식암(息庵)·선동암(仙洞庵) 등 8암자를 지었다.
1327년(충숙왕 14년) 원나라 황제 진종(晉宗)의 비가 불경·재물을 시주했고, 1367년(공민왕 16년)에 나옹(懶翁)이 복희암에서 2년 동안 머물렀다. 1555년(명종 10년) 보우(普雨)가 이곳에 와서 청평사로 개칭했고 대부분 건물을 신축했다. 1711년(숙종 37년)에 환성(喚惺)이 중수하고, 1728년(영조 4년)에 각선(覺禪)이 삼존불상을 조성했다. 6·25전쟁 때 구광전(九光殿)과 사성전(四聖殿) 등이 소실됐다.
청평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은 고려시대 이자현이다. 권력의 무상함을 버리고 경운산 서천 계곡 식암에 은거한 이자현은 우리나라 차 문화에 중요한 유적을 남겼다.
우리나라의 차는 삼국시대부터 시작됐다고 전해지며 고려 때는 왕실이나 권력층에서 널리 이용됐다는 기록이 있다. 당시 차는 권력 상류층 문화였다.
이자현 차 유적지는 바로 그런 기록을 뒷받침해 주는 중요한 유적이다. 이자현 찻물터의 구조가 아래위로 두 개의 물웅덩이를 배치한데서 알 수 있는 건 당시의 선비들이 찻물을 세숫물이나 허드렛물과는 다르게 귀중하게 여겼다는 것이다.
선동계곡의 찻물 유적의 근거는 문수원기 뒷면에 '음명다(飮名茶:이름난 차를 마심)'라는 표현이 기록된 것을 보면 분명해지는데 이런 고귀한 찻물자리가 지금은 이자현 세수터로 불리고 있어 안타까움을 준다. 이자현의 호인 진락공 세수터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후대에 이곳을 찾은 조선의 선비들에게서 전해진 기록이 증거라고 하는데 유교가 근본인 조선의 선비들이 고려의 고승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는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자현이 문수원기에 남긴 기록을 무시하고 후대에 다녀간 이들의 기록을 근거로 세수터라 낮춘 것은 마땅히 바로잡아야 한다.
문화의 품격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900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문화재를 세수터로 만들 것인지, 혹은 차 유적지로 만들 것인지는 우리의 판단에 달려 있다.
또한 이 사찰에 있는 명승 제70호 고려정원은 지금까지 밝혀진 정원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일본 교토의 사이호사(西芳寺) 고산수식(枯山水式) 정원보다 200여 년 앞선 것으로 알려졌다.
구성폭포에서 식암에 이르는 2㎞ 9,000여 평의 방대한 지역에는 계곡을 따라 주변의 자연 경관을 최대한으로 살려 수로를 만들었다. 계곡의 물을 자연스럽게 정원 안으로 끌어들여 영지에 연결시켜 자연의 섭리에 순응해 선(禪)을 익히는 정신수양의 도량으로 짜임새 있게 가꾸어졌다.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온 선조들의 지혜가 코로나19를 맞은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김남덕·오석기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