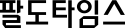5대 특례시 중 창원만 인구 증가율↓
지정기준, 행정수요 등 고려해야
비수도권 특례 지원 필요성 강조
법적특례·세수 이양 방안 강구를
비수도권 인구 감소세가 심화되는 가운데 지방소멸 극복과 지역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 비수도권 특례시에 대한 지정 기준을 변경하고 특별법 제정을 통해 광역적 기능 수행 등 도시로서 위상을 높여갈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접근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자성 창원시정연구원 사회문화연구실장은 6일 창원시자치분권협의회 주관·창원시 주최로 리베라컨벤션에서 열린 ‘비수도권 특례시의 위기와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특례시 기준 검토와 쟁점 관련 주제 발제를 통해 “창원시 인구는 2030년 95만명대, 2040년 87만명대 정도로 전망된다. 2047년 수도권 제외 전 지역이 소멸위험지역 지정 가능성이 있다”며 “5대 특례시를 기준으로 봐도 2000년부터 2024년까지 인구 연평균 증가율은 화성시가 6.99%, 용인시 4.34%, 고양시 1.23%, 수원시 0.96%로 수도권 특례시는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 특례시인 창원은 -0.34%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례시 지정은 100만 인구수 단일 기준에서 행정수요와 파급력 등 여타 역량을 고려해 재설정이 필요하며, 비수도권 권역기능 관점으로 특례시가 광역적 역할로 전환 노력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금창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은 특례시지원특별법과 관련한 주제발제에서 “앞으로 인구 감소 전망이 그대로 나타날지 지켜봐야 한다. 특례시의 경우 특정 단일 시가 인구가 증가해 도달할 수도 있고, 창원시와 같은 통합되는 사례가 추가로 나타날 수 있다”며 “행정안전부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특례시지원특별법안이 있지만, 법안마다 내용이 각기 다르다. 특히 비수도권에 대한 특례 지원은 빠져 있는데, 현재의 인구 추이를 볼 때 비수도권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다. 특례시가 재정 특례 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권경환 경남대 교수가 진행을 맡아 이경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정숙 충북대 교수, 김흥주 세종연구원 연구위원, 박진우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문동진 전주시정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특례시 기준 변경과 입법 필요성을 논의했다.

이경은 부연구위원은 “특례시가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어떤 가치를 창출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질문을 제도 설계의 중심에 놓아야 할 시점”이라며 “특례시는 행정구역상 기초지자체이지만, 실제 수행하는 기능은 준광역 또는 메가시티급의 범위에 해당한다. 그에 따라 국가 정책의 확산 기반이자 실험 무대, 전략적 허브로서의 위상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흥주 책임연구위원은 “법적 특례, 세수 이양, 자치입법적 특례 등 다양한 제도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하고 중앙과 지방 간 협력 체계가 필수적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