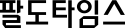칸테(노래)와 기타 연주에 맞춰 심오하고 장중한 플라맹고를 추던 그 여인은 정녕 집시였을까. 비장한 표정과 열정적이며 절도 있는 춤사위로 절망과 고뇌 그리고 또 무엇을 그녀는 몸짓으로 말하고 싶었던 걸까. 두엔데(duende, 예술에 신들린 영혼), 스페인내전에서 우파 민병대에 의해 서른여덟의 나이로 사살된 가르시아 로르카의 시에 깃들었다는 그것일까. '… 평원 속으로, 바람 속으로, 검은 조랑말, 붉은 달. 죽음이 나를 보고 있네 …'
마드리드 콤플루텐세대학 앞에서 나는 일행들에게서 뒤처지면서도 서늘한 그늘이 진 대학건물 내부를 자꾸 들여다보았다. 1920년대 이곳에서 집시의 피가 섞인 아버지와 유대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시인 로르카는 살바도르 달리, 루이스 부뉴엘, 후안 라몬 히메네스와 더불어 두엔데의 신비로운 감각으로 다다와 초현실주의 예술을 마음껏 구가했으리라.
여행 당시 중국 완다그룹에 팔렸다는 스페인빌딩 앞에 다다르니 세르반테스와 로시난테를 탄 돈키호테, 창을 든 산쵸가 서 있다. 스페인왕조의 궁전들과 레알마드리드의 왕관엠블럼이 걸린 경기장, 그랑비아 거리, 솔(Sol) 광장도 좋았지만 예술의 마법에 휩싸인 듯한 프라도미술관은 매혹적이었다.

◆엘 그레코, 디에고 벨라스케스 그리고 프란시스코 고야
그곳에 '쾌락의 정원'이 있었다. 몇 년 전 우연히 들른 오사카시립미술관에서 운집한 관람객들 틈새로 밀리면서 봤던 히에로니무스 보쉬다. 작품 앞은 관람객 없이 아주 한산하여 보고 또 본다. 아아, 계속 보고 있어도 질리지 않는다. 화가의 출렁거리는 상상이 소박한 에덴동산에서 우주선을 닮은 화려한 성들과 기화요초 가득한 쾌락의 정원을 건너 불타오르는 지옥까지 보고 또 봐도 계속 나를 붙든다.
엘 그레코의 '삼위일체', 슬퍼하는 천사의 얼굴에서 나는 톨레도대성당 성물실 전면에 걸려있던 '베드로의 눈물'을 떠올린다. 그리고 수많은 여행자들과 마찬가지로 그 그림 앞에 붙박혀 걸음을 떼지 못한다. 엘 그레코는 인간 내면의 회한을 그림으로 나타낸 몇 안 되는 화가 중의 한 사람임에 틀림없다. 어쩌면 그는 예수처럼 우리가 앓아야 할 병과 후회를 그림으로 대속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알브레히트 뒤러의 '아담과 이브'는 우리가 길에서 만나는 여느 청년들과 다를 바가 없다. 실제보다 훨씬 크게 그린 태초의 인간들에게 사과를 가지째 꺾어 유혹하는 화사(花蛇)조차 몸놀림이 경쾌하기 짝이 없다. 해부학적 인체 묘사와 가장 아름다운 자세를 보아내는데 당대 최고라는 말이 맞다. 역시 그의 그림 어디에나 있다는 서명은 이브가 든 나뭇가지에 달린 조그마한 명판에 '알브레히트 뒤러가 1507년에 완성했다'란 문장으로 있다.
아아, 찬탄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페테르 파울 루벤스의 '세 명의 미의 여신'은 황홀하다. 꺄르륵, 나뭇잎 구르는 바스티유광장에서 서로 어깨를 툭툭 치며 걸어가던 복숭아빛 뺨의 소녀들이 르느와르 그림에서 나온 듯해 감탄한 적이 있어, 아글라이아, 탈레이아, 유프로시네 중 가장 왼쪽에 그려진 여신이 루벤스의 젊디젊은 두 번째 부인 헬레나 푸르망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벨라스케스의 궁정의 시녀들
세비아 사람 디에고 벨라스케스는 야망이 컸다. 궁정화가가 되리라 꾸었던 꿈을 기어코 이루고 산티아고 기사 작위를 받아 귀족이 되었다. 물론 그 야망만큼 실력도 대단했다. 그의 작품 '라스 메니나스(Las Meninas, 궁정의 시녀들)'은 미술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작품이다. 모네는 그를 '화가 중의 화가'라 칭송했고, 소년 피카소는 그 그림을 보고 58점의 패러디 작품을 남겼다. 그는 펠리페4세의 초상화를 가감 없이 사실 그대로 그려 관람객에게 왕가의 근친혼으로 유전된 주걱턱을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다.
'라스 메니나스'의 금발 소녀 마르가리타 공주를 그는 자신의 딸처럼 사랑했지만, 훗날 신성로마제국의 황제와 결혼하기 전까지 합스부르크왕가로 보내는 초상화에선 점점 턱이 길어지는 공주의 모습을 그릴 수밖에 없었다. 안타깝게도 마르가리타는 21살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고 벨라스케스가 그린 초상화를 본 라벨은 '죽은 왕녀를 위한 파비느'를 작곡한다.
이 지면을 통해 고백하건대 나의 스페인 일주는 프라도미술관의 프란시스코 데 고야를 보기 위해서였다. 도판으로 본 '벌거벗은 마하', '옷 입은 마하'는 너무 고혹적이어서 언제가 원화를 보겠다는 게 나의 이십대 버킷 리스트 중 하나였던 것이다. '이성이 잠들면 괴물이 눈을 뜬다.' 등의 그의 그림 제목은 아포리즘 그 자체였고 우울한 그의 자화상을 보고 있노라면 롤랑 바르트의 풍크툼 같은, 무언지 모를 아릿한 옛 기억의 통증을 부르곤 했던 것이다.
벨라스케스를 오마주한 그도 궁정화가였지만 청각을 잃고 비탄에 빠져 '귀머거리 집'에 은둔하며 당시 유럽 전역의 전쟁과 인간의 광기를 지켜보며 극도의 인간 혐오에 빠져 아이를 잡아먹는 사투르누스 등의 검은 그림만 그렸다. 그가 궁정화가로 재직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린 화려한 로코코양식의 '카를로스 4세 가족 초상'은 타락한 왕실의 모습을 풍자한 것이었다.

◆고야의 1808년 5월 3일
'1808년 5월 3일'은 나폴레옹이 마드리드를 점령하고 자신의 동생을 스페인 왕으로 삼자 저항하는 마드리드 시민 수천 명을 처형하는 그림이다. 이 그림은 나중에 피카소가 패러디하여 '한국에서의 학살'로 그려 우리 역사와도 떼래야 뗄 수 없는 인연이 생긴다. '그러나 구원 따위는 오지 않는다.'란 제목이 붙여진 이 반전화 외 또 한 점의 그림 '1808년 5월 2일'은 프랑스군과 이집트용병들이 맨손 또는 고작 나무 몽둥이를 들고 저항하는 마드리드 시민들을 총과 칼로 무참하게 살해하는 장면을 그린 것이다. 나폴레옹군 패퇴 후 복구된 왕정의 귀족들과 페르디난도7세의 전제정치에 환멸을 느낀 자유주의 개혁파 고야는 지병치료를 핑계로 프랑스로 망명하여 1828년 보르도에서 객사한다.
겨우 한나절 프라도미술관에 있었을 뿐인데 18세기와 19세기를 넘나든 듯 나는 지친다. 티치아노, 리베라, 무리요, 수르바란을 비롯한 수천 점의 미술품들이 손에 잡힐 듯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뉴욕 메트로폴린탄미술관과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에르미타주 미술관에서의 무력감을 다시 느끼며 나는 계단 한켠에 앉아 물을 마신다.

프라도미술관과 지척 거리에 있는 레이나 소피아미술관으로 '게르니카'를 보러가야 하는데 고야의 검은 그림들을 보고나니 맥이 탁 풀린다. 게르니카는 스페인 내전 당시 왕당파와 프랑코가 독일의 히틀러에게 요청하여 바스크지역 주민 1,600명을 사상한 것을 분노한 피카소 불멸의 역작 아니던가. 또 고흐, 피사로, 샤갈, 달리, 리히텐슈타인, 호퍼 등을 비롯한 13세기부터 20세기까지의 작품이 가득한 살구빛 벽이 아름다운 티센 보르네미사미술관도 바로 지척이다. 아아, 나는 폴 엘뤼아르가 쓴 게르니카의 승리 '모든 것을 견디는 얼굴'에 피카소의 말 '예술은 고통과 슬픔에서 싹튼 것이다.'를 덧붙여 두엔데에 휩싸인 마드리드를 오늘도 찬양한다.

박미영(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