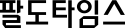제주4·3을 바라보는 시각은 74주년째인 지금까지도 여전히 상반된 양극이 존재한다. 한쪽에선 남로당 빨갱이들이 일으킨 국가 전복 사건이란 시각이고 다른 한쪽에선 국가 권력이 민간인들을 불법 학살한 사건이라고 주장한다. 참으로 오랜 세월을 그렇게 척지고 대립해왔다. 전자 쪽 주장이 반세기 동안 무소불위로 득세하다가 새천년 들어서면서 점차 후자 쪽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다.
전자니 후자니, 좌익이니 우익이니를 떠나 제주4·3에 대한 엄연한 사실 하나가 존재한다. 무장대 수백 명을 진압하기 위해 군경 수천 명이 동원됐고 그 와중에 민간인 수만 명이 희생됐다는 사실이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팩트다.
제주 원도심의 관덕정 앞은 섬사람들의 민의가 모이는 중심 현장이었다. 육지로 치면 서울시청 앞이나 광화문광장과 비슷한 기능이다. 뭔가 하소연하거나 울분을 표하고 싶을 때 섬사람들은 이곳 관덕정광장으로 모여들곤 했다. 4·3사건의 진행 또한 같은 맥락이었다. 이 광장에서 발단이 됐고 이 광장에서 일단락됐다.

1947년 3월 1일 제주북국민학교로 모여드는 섬사람들 심정은 비장했다. 해방 1년 반을 보냈지만 예전이나 지금이나 생활은 나아진 게 없었다. 일제에 빌붙어 악랄하게 굴던 친일분자들은 다시 경찰이나 관료로 미군정에 등용되어 변함없이 위세를 부리고 있었다. 미군정의 공출도 일제 때 못지않게 심했다. 25만 명 이하였던 제주 인구는 해방과 함께 30만 가까이로 폭증하는 중이었다. 작년에 몰아친 전국적 대흉년 여파는 도민들의 삶을 극도로 피폐하게 만들고 있었다.
학교 운동장에서 3·1절 행사를 마친 사람들은 그저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뭔가라도 붙들고 하소연하고 싶었던 것이다. 시위 행렬 인근을 지나던 기마경찰의 말발굽에 어린아이 한 명이 치이며 쓰러졌다. 어쩐 일인지 그 기마경찰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인근 경찰서 쪽으로 가버렸다. 격분한 시위대 사람들이 경찰을 쫓아가 항의하며 돌멩이를 던졌다. 한동안 소란이 일던 어느 순간 여러 발의 총소리가 울려 퍼졌다. 갑자기 광장은 아수라로 변했다.
이날 경찰의 이 발포로, 젖먹이를 안고 있던 여성과 초등학생 한 명을 포함해 여섯 명이 사망한다. 이날의 이 돌발 사건이 그렇게 오랜 시간 제주 섬을 피로 물들이는 불씨가 될지는 당시의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일제강점기 동안에도 백주대낮에 그런 일은 없었다. 그만큼 섬사람들에겐 경악할 사건이었지만 그래도 책임자 사과와 관련자 처벌로 꺼질 수는 있었던 불씨였다.
당국자들의 독선과 강압과 무책임이 불씨를 키웠다. 그리곤 1년 뒤 그 불씨는 대형 폭약으로 점화돼 버렸다. 1948년 4월 3일 새벽 중산간오름들 위에서 일제히 횃불이 일었던 것이다. 이후 수백 명의 무장대와 수천 명의 군경 사이에서 수만 명의 민간인들이 이리저리 휘둘리며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가기 시작했다. 서북청년단이니 민보단이니 산사람이니 폭도니, 해안선 5㎞ 밖이니, 초토화 작전이니, 학살 또 학살, 제주도 역사상 가장 무참했고 가장 길었던 1년이 그렇게 지나갔다.
그리곤 1949년 6월 어느 날 수많은 사람이 운집한 관덕정 광장에 시신 한 구가 내걸렸다. 몇 달을 입고 있었는지 다 해어진 카키색 군복에 편안히 잠든 젊은이의 시체였다. 두 팔을 벌리고 한쪽으로 고개가 기울어진 채 높은 십자가 틀에 묶여 있었다. 광장의 사람들은 십자가 시신과 그 옆 ‘이덕구의 말로를 보라’고 쓰인 문구를 침묵 속에 바라보고 있었다. 본보기 삼아 학생들도 보라고 동원한 건지 교복을 입은 아이들도 많았다. 2년 전만 해도 시골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교사 이덕구였다. 교복을 입은 아이들 중에는 ‘선생님’ 하며 혼자 중얼거리던 제자도 있었다.

사람들은 그저 말이 없었다. 긴 한숨소리들만 신음처럼 여기저기서 들려올 뿐이었다. 이제 우리는 살았다는 안도감, 뭔가 모를 슬픔과 분노, 또는 왠지 모를 미안함 등이 교차된 한숨들이었다. ‘폭도 우두머리’ 혹은 ‘산사람들 대장’으로 불렸던 무장대 사령관 이덕구가 그렇게 죽음으로써 제주 섬에는 슬픈 평화가 찾아왔다.
그렇게 다 끝났는가 했다. 이듬해엔 온 동네 전체 혹은 한 동네 여러 집들이 같은 날 저녁 제사상 앞에 절하는 풍경이 섬 곳곳에서 이어졌다. 그나마 고인의 사망 날짜라도 아는 가족의 집들이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 혹은 어느 날 불쑥 살아 돌아올지 알 수 없는 이들의 가족들은 오히려 제삿집이 부러웠다.
그렇게 1년 이상을 숨죽여 지내던 어느 날 ‘북괴가 38선을 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멀리 육지에서 일어난 일이겠거니 무심해 하는 동안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왔다고 난리들이다. ‘그래도 설마 제주까지야’ 하던 어느 날 ‘사람들이 붙잡혀간다’는 소문이 들기 시작했다. 소문은 급속도로 퍼졌고 모두가 사실로 확인되었다.
한여름의 제주는 다시 얼어붙었다. 1년 전까지의 그 무시무시했던 악몽이 되살아난 것이다. 소위 ‘예비검속’의 광풍이었다. 북괴에 동조할 가능성이 있다는 혐의만으로 수천 명의 주민들이 삽시간에 체포됐고 이들은 섬 여기저기에 잠시 분산 수용됐다. 그리곤 여러 날 밤과 새벽, 군용트럭들이 들락거리면서 그들 대다수는 어디론가 실려 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임을 당했고 암매장되거나 그대로 버려졌다.
학살 장소가 알려지거나 유해가 발굴되는 등 사건의 실체가 밝혀진 건 훨씬 훗날의 이야기다. ‘죽은 자들은 빨갱이였고 그 가족들 또한 빨갱이’라는 억지 혐의 속에 모두가 쉬쉬하며 반세기 가까운 세월을 숨죽여 살아야 했다. 6·25전쟁이 끝나고 마지막 토벌 작전이 있은 후인 1954년 9월 한라산 금족령이 해제되면서 비로소 제주4·3은 끝이 났다. 7년 7개월의 긴 세월이었다. 설문대할망이 한라산을 만들고 고양부 3씨가 자손을 이어간 탐라 섬에 여태껏 이렇게 무참한 세월은 없었다.
제주일보 jjnews1945@jejusin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