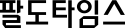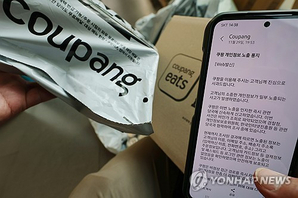며칠 전 성탄절이 막 지난 12월 26일, '남아공 케이프타운의 한 요양소에서 데즈먼드 투투 대주교 선종(善終)'이 속보로 떴다. 90세, 차별과 전쟁의 시기를 보낸 인류에게 두 세기에 걸쳐 화해와 용서, 웃음과 무지개 세상을 선물하고 떠난 한 위대한 인물의 소천이었다. '우리에게 자유를! 우리 모두에게! 흑인도 백인도 함께!(We will be free! All of us! Black and white together!)' 전 생애를 통해 혼신을 다해 그가 던진 메시지는 남아공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전 인류에 던지는 예언에 다름 아니었다.
넬슨 만델라와 함께 아파르트헤이트(흑백 차별정책)를 펼친 남아공의 백인정권에 결연히 맞섰던 투투 대주교는 그 정권이 종식되었을 때 '용서없이 미래는 없다.'는 호소로 전 세계 흑인과 백인 모두에게 국가의 양심, 화해의 정신으로 존경받아 왔다. 팬데믹 환란의 2021년을 보내는 이 시간, 굳건한 정신의 걸음으로 나쁜 역사의 한가운데를 걸어간 한 거인의 발자취가 그래서 더욱 강력한 여운을 남긴다.
그 와중에 1488년 포르투갈의 바르톨로뮤 디아스가 희망봉(喜望峯, Cape of Good Hope)을 발견해내지 않았으면 어떠했을까. 아니, 그곳을 발견했더라도 모든 인간 존재를 양도할 수 없다는 최소한의 존엄성이라도 지켰더라면 어땠을까를 상상해 본다. 그랬더라면 향후 노예, 노예상, 노예무역, 노예선, 식민지, 정복, 전쟁과 약탈, 폭압, 아라파트헤이트란 나쁜 역사에 인류가 내몰리진 않았을 거라는 역사엔 가치가 없다는 가정을 해보는 것이다.

◆희망봉(喜望峯, Cape of Good Hope)
사실 바르톨로뮤 디아스가 그곳에 처음 붙인 이름은 희망봉이 아니었다. 첫 이름은 그 근해에서 만난 거친 폭풍우로 심하게 고생했기 때문에 붙인 '폭풍의 곶'이었다. 지도를 보면 15세기 유럽 항해자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유럽에서 기나긴 아프리카 서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처음으로 동쪽으로 꺾을 수 있는 대서양과 인도양이 마주치는 곳을 만난 고난이 그것이다.
1497년 바스쿠 다 가마가 드디어 그곳을 통과하여 인도까지 항해하고 돌아오자 포르투갈의 주앙 2세는 기쁨에 겨워 지명을 희망봉이라 고쳤다. 유럽인들에게는 희망, 아프리카 현지인들에게는 불행의 시작이 된 명명(命名)이었다. 당시 근대 유럽인들의 대양항해 욕망 중 하나가 향신료와 황금이 가득한 인도를 찾아가는 것이었는데, 당시의 항해술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아프리카 지리에 대한 지식으로 최남단에 도착했다는 착각이 그대로 와전된 명명에 다름 아니었다. 실제 아프리카 최남단은 희망봉에서 동남쪽으로 더 내려온 아굴라스곶 서쪽의 해안 절벽이다.
희망봉 팻말이 붙은 포인트에서 수많은 관광객들 사이 줄을 서서 사진을 찍고 등대를 향해 오르기 시작했다. 발 아래 대서양과 인도양의 접점 드넓은 바다에선 파랑이 일고 있었다. 돌담과 돌계단으로 된 둘레길을 오르며 이 중간 정박지로써의 좋은 조건 때문에 네덜란드인, 프랑스계 신교도들(위그노), 독일인, 영국인 등의 식민지였던 남아공의 개국 역사를 오래 생각했다. 수에즈운하가 개통되어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짧은 항로가 생기자 이젠 관광지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이곳 희망봉, 나는 서글펐다.

희망봉 근처답게 이름 붙여진 두 바다(two oceans) 레스토랑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맥주를 곁들인 랍스터 요리로 점심을 먹고 아름다운 해안도로 체프먼스 피크를 달려 볼더스 비치로 갔다. 볼더스 비치는 자카스 펭귄의 서식지다. 펭귄들은 귀엽게도 핑크빛 볼과 이마를 하고 있었다. 낮이면 점점 달궈지는 뜨거운 태양에게서 눈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니 일종의 보호색인 셈이다. 앙증맞은 작은 몸체로 니밀락내밀락 걸어다니는 펭귄 무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전혀 개의치 않는다. 무분별한 남획으로 멸종 위기를 겪다가 1982년 마지막 남은 한 쌍의 펭귄으로 지금의 단일 대집단을 이뤄냈다니 아마도 사람들의 관리와 보호가 익숙한 모양이다.
반달처럼 휘어진 캠스베이를 지나 수많은 요트가 정박된 하우트베이 포트에서 배를 타고 도이커섬으로 향했다. 이젠 수많은 물개들을 볼 차례다. 바다는 계속 푸르렀고 멀리 테이블 마운틴의 사자 머리 뒷모습이 보였다. 요트를 타고 도착한 도이커섬 주변엔 미역 줄기가 한바다 가득했고 그보다 더 많은 물개들이 거대한 몸집으로 바위 위에 누워 있거나 바다 속으로 느리게 뛰어들고 있었다. 요트로 빙빙 돌며 그들을 바라보며 왁자하게 소리를 질러도 사람들에겐 관심도 없는 노곤한 얼굴들이다.
돌아오는 요트 위에서 로벤섬에 대해 누가 일러준다. 우리 관광일정에는 들어있지 않은 정치범 수용 감옥섬이다. 넬슨 만델라가 27년 복역 중 19년을 그곳에 갇혀있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한센병 환자 수용소였다가 정치범 감옥을 거쳐 지금은 관광지다. 차를 달려 케이프타운 도심으로 접어들 때 바람과 구름이 심상치 않았다. 관광객인 나는 내일 테이블마운틴 국립공원을 오를 수 있을까.

◆케이프타운, 테이블마운틴
남아공은 4개의 수도를 가지고 있는데, 행정수도는 프리토리아, 사법수도는 블룸폰테인, 경제수도는 요하네스버그이며 케이프타운은 입법수도다. 케이프타운은 '남아공의 유럽'이다. 전체 인구 중 백인 비율이 15%에 불과하지만 이곳은 남아공에서 유일하게 백인이 흑인보다 많다. 비교적 치안이 안전하며 도심은 현대적으로 잘 형성되어 있다. 아라파트헤이트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은 유색인들이 그 상징으로 자신들의 집을 파스텔 물감으로 칠한 화려한 보캅마을은 슬픈 동화 같고 인근의 노예박물관은 입구에서부터 방문객들을 그 장중한 억압감으로 숨차게 했지만 말이다.
그 슬픔 때문이었을까. 테이블마운틴(Table Mountain)은 우리에게 끝내 제 몸을 열어주지 않았다. 비, 구름, 바람이 번갈아가며 몰려 들었다. 360도로 회전하며 전 시내를 볼 수 있다는 푸니쿨라도 운행을 일시 중단했단다. 또 슬펐다. 그 대신 들른 키르스텐보스 국립식물원은 말 그대로 아프리카의 지속가능한 환경의 희망을 보여주는 듯했고 푸른 정원과 오래된 포도나무 그리고 농장의 가로수가 아름다운 와이너리에서의 시음은 그 슬픔을 일시나마 진통시켜주었다.

도심의 롱 스트리트는 긴 거리, 즉 대구 사투리로 말하자면 진골목이다. 카페와 앤틱상점들이 많아 나의 쇼핑 본능을 자극시키기에 충분했다. 기관단총을 든 경비원들이 삼엄한 표정으로 입구를 지키는 앤틱상점에서 심상찮아 보이는 카메오를 몇 개 샀는데 이베이에서 골동품 경매를 한다는 여행 안내자가 백년이 넘은 빅토리아조 브로치란 감정을 해주었다. 일종의 작은 횡재를 한 것인데 그가 자신과의 동업을 들먹이며 남아공 이민을 권할 땐 나는 정말 아라파트헤이트를 끊어낼 때의 넬슨 만델라처럼 강경하게 거절하며 케이프타운을 떠나는 요하네스버그행 관광버스를 탔다.

글 박미영(시인),사진 유가형 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