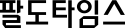2000년 85세를 일기로 타계한 그는 70년 창작활동 기간 시집 15권, 시 1000여 편을 발표했다. 한국인들이 애송하는 ‘국화옆에서’를 비롯해 ‘푸르른 날’ 등 주옥같은 작품을 남겼다. 그러나 그에게는 친일과 군사독재 부역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바로 미당(未堂) 서정주다. 한국 문학사에서 미당 서정주만큼 논란이 되는 문인도 드물다. 뛰어난 문재를 지녔지만 그의 행적은 비판을 면치 못했다.
시인 서정주를 떠올리면 늘 감탄과 아쉬움이 교차한다. 최고의 서정시인이라는 상찬 이면에 드리워진 부끄러운 행적 때문이다. “시는 시이고 삶은 삶”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시행일치(詩行一致)를 견지했던 문인들도 적지 않은 상황에서, 미당의 행적은 분명 비판 받아 마땅하다. 그럼에도 한국 시사(詩史)에서 최고의 서정시인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미당을 친일의 이유로 문학사에서 배제한다면 한국문학의 공백은 상상 이상일 것이다.
고창에 갈 때면 언제나 선운사와 미당이 떠오른다. ‘선운사 동구’라는 시는 고창과 함께 동일선상에서 환기된다.
선운사 골째기로
선운사 동백꽃을
보러 갔더니
동백꽃은 아직 일러
피지 안했고
막걸릿집 여자의
육자배기 가락에
작년 것만 상기도 남었습디다
것도 목이 쉬어 남었습디다.

그렇게 선운사를 지나 미당의 흔적이 있는 곳으로 향한다. 한두 송이 동백이 떨어진 잔상을 머리에 두고 떠나려 하니 “막걸릿집 여자의 육자배기 가락”이 어디선가 들려오는 것 같다. 붉은 동백꽃의 아슴한 향기가 그립지만, 그러나 서둘러 선운사를 휘돌아 나간다.
고등학교 시절 문학을 가르치던 선생님은 서정주 시를 줄줄 외우곤 했다. 시인이었던 선생님은 미당의 시를 읽노라면 절망감이 든다고 했다. ‘어떻게 우리말을 그렇게 아름답게 풀어낼 수 있는지 미당의 시 앞에서는 시를 쓴다는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게 선운사 동구를 지나 얼마쯤 달렸다. 이마 와버린 봄은 이편의 마음은 아랑곳없이 어디로든 달려간다. 봄은 그렇다. 소리 소문없이 다가와 살포시 자신을 알린다.
봄기운 때문이었을까. 미당에 대한 안타까움이 아련히 밀려든다. 그는 언어를 부리는 솜씨에 있어 추종을 불허할 만큼 빼어났다. 물론 시와 시인을 분리할 수 없지만, 부정적인 행적만 없었다면 미당은 한국 현대시사를 대표할 만한 문인으로 손색이 없을 거였다.

미당시문학관은 지난 2001년 폐교된 선운초등학교 봉암분교를 개조해 건립됐다. 문학관 인근에 생가도 복원됐다. 미당은 어린 시절 이곳에서 시적 감수성을 키웠을 것이다. 한학을 배우고 중앙불교 전문강원 수학 후, 미당은 1936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벽’이 당선된다. 이후 김광균, 김달진, 김동리 등과 동인지 ‘시인부락’을 주재하면서 본격적인 창작활동을 펼친다.

문학관 내부는 소박하다고 해야 할까. 전체적인 분위기는 오래된 시골 학교 풍경과 다르지 않다. 1층 전시실은 시인으로서의 미당을 엿볼 수 있는 공간이다. 생전의 활동사진, 시집들이 비치돼 있다. 2층에서는 미당 서정주의 다양한 면모를 가늠할 수 있다. 지인과 주고받은 편지에서는 미당의 인간적인 성정이 엿보인다. 파이프와 지팡이, 사진은 얼마 전까지도 그가 실존했다는 사실을 명징하게 보여준다.
전시실의 가장 꼭대기, 옥상으로 향한다. 선운리와 질마재 마을의 풍경을 조감할 수 있다. 과연 ‘시인부락’을 잉태할 만한 정경이다. 고창의 동항과 변산의 궁항이 바다와 갯벌로 이어지고, 질마재 마을은 내륙 안쪽에 박혀 있는 형국이다. ‘시인의 마을’이라는 이름에 온전히 값하는 풍경이다.
미당을 알린 대표 작품집 ‘질마재 마을’은 이름부터 시적이다. 아니 신화적이다. 몽환적인 느낌이 감도는 걸 보면 그의 시에 깃든 자장이 만만치 않음을 짐작케 한다. 그러므로 그의 명언 “나를 키운 건 팔할이 바람이었다”는 “나를 키운 건 팔할이 고향이었다”로 바꿔 말할 수 있겠다.
다음은 시집 ‘질마재신화’에 나오는 ‘신부’라는 시다. 생가에서 떠올리는 작품은 사뭇 설화적이다.
“신랑신부가 첫날밤을 맞이했다. 긴장한 신랑은 갑자기 요의(尿意-오줌이 나오려는 생각)를 느꼈다. 급한 신랑은 서둘러 방을 나섰다. 그때 뒤에서 무언가가 신랑의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신랑은 음탕한 신부의 소행이라 여겼다. 기분이 상한 신랑은 옷이 찢어지건 말건 홱 뿌리치고 나왔다. 이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길로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았다.
그로부터 사오십 년 지났다.(중략) 그날 밤, 신랑을 붙잡은 건 신부가 아니었다. 실은 옷이 방문 돌쩌귀에 걸린 것이었다.”
(‘질마재신화’에 수록된 ‘신부’ 중에서)
‘신부’는 우리나라 전역에 퍼져 있는 신랑신부 첫날밤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다. 이야기 배경과 사건은 한번쯤 들었음직한 내용이다. 그것은 ‘질마재’를 전통 마을 어느 곳에 대입시켜도 무방하다는 얘기다.
이곳에서는 매년 가을이면 시문학제가 개최된다. 전국에서 미당의 시를 흠모하는 이들이 찾아와 샛노란 국화 향기 속에서 축제를 즐긴다. 시낭송회, 백일장, 시극 공연 등이 펼쳐지고 다양한 문학예술행사도 열려 마을은 온통 국화향과 문향에 휩싸인다.
흔히 미당을 가리켜 “우리말 시인 가운데 가장 큰 시인”이라고 평한다. 우리말을, 전라도 방언을 그만큼 구성지고 맛깔스럽게 구사한 시인은 없다. 미당의 시는 오늘의 우리에게 문학의 미학과 아울러 시인으로서의 삶 등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글·사진=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