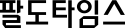오미크론, 이러다 오메가까지 가겠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종에 붙은 그리스 알파벳을 가르쳐 준 친구의 걱정 가득한 문자가 왔다. 아, 이 시국에 이 글을 계속 써야 하나. 나도 회의가 왔다. 코로나가 끝나면 가고 싶은 그 곳이라니, 시쳇말로 희망 고문이며 코로나로 분노한 구독자들 심사에 화만 가일층 돋우는 건 아닐까.
원고 마감일 아침까지 고민했다. 그러다가 문득 판도라의 상자 속 유일하게 남은 것을 떠올렸다. 희망이다. 그렇다. 인간이 겪을 온갖 재앙이 상자 밖을 빠져나가 세상을 횡행하며 위협을 해도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 기필코 코로나를 물리칠 수 있으리라는 희망, 필히 마스크를 벗고 지낼 수 있으리라는 희망, 반드시 예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 그렇다. 이 어쭙잖은 글이나마 그 희망에 보탤 찰나를 비추는 햇빛 한 톨 크기 위무라도 된다면... 이렇게 스스로 주문을 걸고 아름답고 푸른 다뉴브강을 떠올린다.

◆부다페스트, 다뉴브의 장미
다뉴브강에 살얼음이 지는 동구(東歐)의 첫 겨울 / 가로수 잎이 하나 둘 떨어져 뒹구는 황혼 무렵 / … / ―너는 열세 살이라고 그랬다. / 네 죽음에서는 한 송이 꽃도 / 흰 깃의 한 마리 비둘기도 날지 않았다. / 네 죽음을 보듬고 부다페스트의 밤은 목 놓아 울 수도 없었다. / 죽어서 한결 가비여운 네 영혼은 / 감시의 일만의 눈초리도 미칠 수 없는 / 다뉴브강 푸른 물결 위에 와서 / 오히려 죽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소리 높이 울었다.
1956년 10월 23일, 부다페스트 시민들은 다뉴브 강변의 바므광장 건물 옥상의 붉은 별을 떼어내며 구(舊) 소련의 스탈린주의 관료집단과 공포정치에 반대하는 항쟁을 시작했다. 그 결과는 무참했다. 소련은 탱크와 장갑차로 부다페스트로 진입했고 진압군은 시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눴다. 부다페스트에서만 3천명의 사망자가 나온 이 항쟁에 전세계인들은 공분했고 시인 김춘수는 '부다페스트에서의 소녀의 죽음'을 썼다. 이후 이 항쟁은 헝가리혁명이라 명명된다.
그로부터 50년 후 어느 날의 황혼 무렵 나는 다뉴브강 세체니 다리 난간에서 그 시를 떠올리며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았다. 세체니 다리는 부더와 페스트를 이어주는 아름다운 현수교로 체인 브리치로 불리기도 한다. 그날도 다뉴브의 강물은 푸르렀고 나는 감회에 젖어 다리 입구에 세워진 혀 없는 사자상을 바라보았다.

강바람이 불어와 내 얼굴을 스치고 머리칼을 헝클어뜨렸다. 영화 글루미 선데이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 다리 위를 달리던 그 주인공들이 떠오른다. 아름다운 일로냐와 레스토랑 주인 자보가 자신이 만든 곡이 많은 이들의 자살을 불러왔다는 사실을 알고 절망한 안드라스를 찾아가던 그 바람 불던 날, 구름도 우울하고 불안하게 흘렀지.
서기 900년경부터 1200년대 중반까지 헝가리를 지배한 몽골계 유목민 마자르인들로 인해 헝가리는 우리와 유사성이 많다고 한다. 특히 어순(語順)과 단어의 유사성, DNA 접점 비율이 타민족보다 월등히 크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헝가리 말이 자꾸 귀에 들어온다. 일제강점기 마자르인들이 우리 독립군에게 무기를 공급하는 등 큰 도움도 주었다고 한다.
부다성은 몽골군이 퇴각한 뒤 헝가리 역사상 최초의 왕가 아르파드왕조의 궁전이다. 중세와 바로크, 19세기 양식의 가옥들과 공공건물들로 유명한 옛 성곽 지역 옆 부다언덕 남쪽 꼭대기를 차지하고 있다. 성이슈트반 대성당은 왕조의 초대 국왕이자 로마 가톨릭교회의 성인으로 추앙받는 이슈트반 1세(975~1038)를 기리기 위해 1851년 세운 성당으로서 엥겔스 광장 근처에 있다.
1541년 헝가리는 다시 오스만제국에 정복되어 부더는 속령 주류지가 되고 페스트는 그 시기에 대부분 버려진 상태였다가 오스트리아에 합병된 17세기 후반부터 발전되었는데, 이후 합스부르크와의 타협으로 오스트리아-헝가리 이중제국 시절인 1873년 현재 형태의 부다페스트로 통합되었다. 부더에 왕궁과 귀족들의 저택이, 페스트에 서민들의 주거지역이 많은 이유다.
엘리자베트(Elizabeth) 또는 시씨(Sissi) 그리고 세계적인 뮤지컬로 잘 알려진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프란츠 요제프 1세의 황후는 부다페스트와 헝가리 국민을 사랑했다. 불행한 개인사로 오스트리아 황궁보다 전세계를 떠돌았던 아름다운 황후는 자신의 조국보다 헝가리를 더욱 사랑한 듯한 행보를 보여 1867년 헝가리 독립을 지지하기도 했다. 부다페스트를 비롯한 헝가리 전역에 그녀의 헝가리어 이름인 에르제베트를 붙인 다리부터 광장과 공원이 곳곳에 있다.
마차시성당 옆 네오로마네스크 양식의 성인 어부의 요새(fisher's fort)는 헝가리 독립전쟁 당시 어부들로 결성된 시민방어군들을 기념한 뾰족한 고깔모양 일곱 개의 탑이 마치 동화에나 나올 것 같은 성이다. 일곱 개의 탑은 7개 마자르 부족을 상징한다고 하니 헝가리인들이 스스로를 마자르라 부르는 이유가 짐작된다. 2차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강압에 의해 추축국이란 오명을 쓰고 유대인 학살이란 등의 이력을 심하게 부끄러워하는 헝가리 국민들은 다뉴브 강가에 주인 잃은 그들의 신발을 조각으로 점점이 형상화해 놓았다. 그것을 보고 있노라니 깊은 한숨이 절로 나온다.

◆부다페스트, 빛의 도시
사실 처음부터 나는 밤의 부다페스트, 야경을 보러 그곳으로 갔다. 세느강변에서 노곤히 졸다가 문득 깨어나 파리의 야경을 보고 감탄하는 내게 친구가 꼭 가보라고 권해준 것을 잊지 않고 있었다. 친구의 말로는 파리의 야경은 부다페스트의 그것에 비할 바가 아니라고 했다. 해발 235m의 겔레르트 언덕에서 내려다보니 실로 그러했다. 그날 그 언덕에서 보석처럼 반짝이는 시가지를 보고 내려와 군델레스토랑에서 먹은 굴라쉬와 황금빛 토카이 와인은 환상 그 자체였다. 그래서 나는 아름다운 부다페스트의 밤을 핑계로 그곳에서 이틀을 더 묵었다.
유람선을 타고 천천히 바라보는 도시의 밤은 낮에 본 성 이슈트반 대성당, 영웅광장, 어부의 요새, 국회의사당 등을 완전히 다른 두 가지 모습으로 만들었다. 독일에서 살았지만 자신이 헝가리인임을 누구보다 강조했다는 프란츠 리스트의 헝가리 광시곡(Hungarian Rhapsody)이 유람선마다 흐르고 있었다. 부다페스트는 실제로 인접한 다른 동구권 국가들의 도시보다 유적이 그리 많은 것은 아니지만 나처럼 이렇게 밤의 풍경에 사로잡혀 며칠을 더 묵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 실감되었다.
아니 내 자신이 그 증명이 되고 말았다. 그 야경과 강물에 얼비치는 이중 불빛에 사로잡혀 연거푸 유람선을 탔다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의 하나가 바로 나니까. 아, 그러고보니 판도라의 상자에 단 하나 남아 인간에게 주어졌다는 희망이란 것이 어둠이 깊은 밤의 부다페스트에 그 불빛 같은 것은 아니었을까란 생각이 문득 든다.

박미영(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