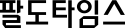"일감도 안 들어오고, 매출도 점점 줄어들어서 다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이 판을 떠나는 추세입니다."
25일 대전 동구 원동 한복거리. '한복거리'라고 새겨진 입간판이 무색할 정도로 한복점보다는 기성복 매장과 수예점이 더 눈에 띄었다. 임대를 구하는 메모가 붙은 채 굳게 닫힌 한복점 셔터 위에는 파리가 앉아 있었다. 입구 인근에서 20년 넘게 영업을 이어오던 이 곳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재정난을 버티지 못하고 한복거리를 떠났다.
이날 문을 연 한복점들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쇼윈도에 진열된 한복들이 하염없이 주인을 기다리는 가운데 유리 너머로 바느질을 하거나 TV를 시청하는 상인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오전 11시가 넘어가도록 문을 열지 않는 곳도 눈에 띄었다. 한 상인은 "세조차 나오지 않을 정도로 수익이 없어 한복업을 계속 이어가야 할지, 문을 닫아야 할지 고민될 정도"라며 푸념했다.
한복거리는 1997년 1월 외환위기 이후 경기 부흥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동구청에서 '특화거리'로 지정한 곳 중 하나다. 중앙시장 메가프라자와 신중앙시장, 중앙도매시장, 중앙종합시장, 자유도매시장 등 약 300여 미터의 거리에 한복도소매업소와 한복제조·수선 업소 등이 고루 분포돼 있다. 당초 한복거리는 선택의 다양성과 저렴한 가격으로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어 지역 대표 특화 산업으로 꼽히기도 했다. 2010년대 중반까지 100여 개의 한복점이 밀집해 있었지만, 현재 약 50-60% 가량의 매장이 남아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한복 산업이 사양길에 접어들며 위기를 겪던 한복거리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직격탄을 맞았다. 코로나19 감염 우려와 하객 수 조정 등 불안정한 상황으로 결혼식을 취소·연기 또는 간소화하는 사례가 늘면서 한복 수요도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이 곳에서 33년 째 한복점을 운영하는 박모 씨는 "한복은 3-5월이 성수기인데, 지난달 중앙시장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손님 발길이 뚝 끊겼다"며 "결혼식도 줄고, 식을 올리더라도 한복을 찾는 사람들이 없으니 장인들조차도 그만두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40년 넘게 한복점을 운영 중인 김모 씨도 "특화거리 지정 이후 이렇다 할 지원을 받은 기억은 없고, 한복점이 줄어드는 추세다 보니 상인들끼리 대책을 모색하기도 어렵다"며 "한복점이 사라진 자리를 옷가게와 수예점이 채우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한복거리'라는 이름만 남을 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구청 관계자는 "한복거리의 경우, 중앙시장 활성화 구역에 포함돼 있어 단독 지원하기보단 중앙시장 특성화 사업에 포함해 지원하고 있다"며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 중인 '상권 르네상스' 공모를 비롯해 시장의 애로사항을 보완하며 낙후된 상권을 살리기 위한 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5일 대전시에 따르면 현재 지역 특화거리는 대덕구 6곳, 중구 3곳, 동구 6곳 등 총 15곳이다.
이태민 기자 e_taem@daej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