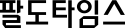안동에 살기 시작했다. 서울이나 대구 등 대도시에 비해 안동에 사니 편안하다. 안동은 좋다. 날마다 안동을 걷고 안동음식을 먹는다.
익숙한 그것들이 어느 날 하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안동의 주름살이 보이기 시작했고 안동이 속살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안동국시와 안동찜닭, 안동간고등어 혹은 헛제사밥의 심심한 내력도 내 귀에 속삭거리기 시작했다.
무심했던 안동에 대한 내 시선이 한결 부드러워졌고 투박한 내 입맛도 호사스럽게 안동을 먹게 됐다.
안동에 대한 거창한 담론이 아니라 그냥 안동이야기다
3- 안동국시
'안동국시'
흔하디 흔한 국수 한 그릇에 지역명을 표기하는 것은 흔치 않는 일이다. 면(麵)의 세계에서는 평양냉면', '함흥냉면' 혹은 '구포국수' 정도가 귀에 들어올 정도로 '안동국시'는 우리에게 특별하게 다가온다.
서울에서는 아예 '안동국시'라는 상호를 내건 국시집들이 꽤나 성업을 한다. 마포와 강남, 종로, 강남에도 있고 아예 안동에 있는 정자이름을 딴 안동국시 전문점도 있다. 그러나 정작 안동에선 '안동국시' 간판을 내건 식당이 드물다.

국시 아니더라도 안동에는 맛있는 먹거리가 '천지 삐까리'로 널려있다. 안동한우, 안동갈비는 시내 어디서나 맛볼 수 있고 '안동찜닭'이나 '간고등어'도 안동사람들은 평소 쳐다보지도 않는다.
안동에선 국수는 '국시'가 된다. '국시'는 봉지에 담긴 밀가루가 아닌 '봉다리'에 든 '밀가리'로 만들어야 진정한 '국시'가 된다는 사투리 때문만은 아니다. 안동국시가 다른 지방에서 흉내 낼 수 없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흔히들 경상도 음식은 맛이 없다고들 한다. 전라도 음식과 비교해서 다양하지 못하다고도 한다. 화려하지도 못하지만 경상도 음식은 꾸미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경상도 특히 경북 음식들은 촌스럽고 투박하다는 인상을 받는다.
안동음식은 투박하지만 절제된 맛을 느끼게 한다. 양반집 한 상이든, 양민의 개다리소반이든 간에 찬의 가짓수는 단촐하고 간은 슴슴하다. 간혹 맵고 짜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안동국시는 그런 안동지방의 음식 문화를 대표한다. 화려하지도 고급스럽지도 비싸지도 않으면서 투박하고 단순하면서도 담백하고 기품있는 한 그릇의 국수. 그것이 안동국시다.
생각보다 안동에는 안동국시를 내놓는 식당은 많지 않다. 한 손가락에 꼽을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물론 국수팔아서 돈이 되지 않는 세태 탓도 있지만 안동국시를 옛 맛 그대로 제대로 뽑아내려면 품이 많이 들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일단 안동국시와 칼국수와의 차이점은 콩가루를 쓰느냐 여부다. 밀가루로 반죽하는 국수에 콩가루를 넣으면 면발이 한결 부드럽고 고소해진다. 지나치게 많이 넣게 되면 콩가루 냄새가 나거나 면발이 쉽게 끊어진다. 적정량은 식당마다 다르지만 대개 30%~40%안팎이다. 대신 다른 첨가물은 일체 넣지 않는다. 서양 국수를 반죽할 때 쓰는 계란이나 다른 첨가물은 서울에 있는 국숫집에서 쓰기도 하는 모양이다. 그러면 면이 반질반질해지지만 안동국시다운 투박한 맛은 사라진다.
다른 지방과 달리 콩가루를 넣은 안동국시가 보편화된 것은 아무래도 안동이 예전부터 콩의 주산지였기 때문이다. 산지가 많은 안동의 특성상 콩은 지천에 널렸다. 집집마다 콩농사를 지어서 '콩부자'인 안동에서는 자연스럽게 비싼 밀가루에 콩가루를 넣는 방식의 국수제조법이 발달한 것이다. 어느 순간부터는 밀가루보다 콩가루가 더 비싼 시대로 역전됐다.

안동국시의 두 가지 버전 중에서 우리가 요즘 먹는 건, '누른 국시'다. '건진 국시'는 양반가 제사 때나 볼 수 있었지만 손이 너무 가서 요즘은 거의 구경하기 어렵다. 건진국시 육수는 밀가루가 귀했던 조선시대에는 말린 은어를 바탕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요즘은 은어 대신 닭육수와 양지육수를 섞고 말린 표고와 청양고추 등을 넣어서 맛을 배가시킨다.
식당에서는 주로 멸치를 기본 베이스로 무와 다시마, 청양고추 등으로 기본 육수를 낸다. 가정집에서는 맹물에 조선간장 넣은 기본 육수를 팔팔 끓이다가 홍두깨로 밀고 칼로 송송 썰어낸 면발을 푸성귀와 애호박 채어 끓여, 고명으로 다진 쇠고기를 얹으면 최고다.
서울에서 먹는 안동국시들은 양지육수나 소뼈 육수 등을 섞어 고기 맛을 내지만 정작 안동에서는 그런 방식의 육수는 쓰지 않는다.
국수 한 그릇을 내놓더라도 안동에서는 정갈한 반찬 몇 가지와 조밥 한 그릇을 같이 내놓는다. 그것이 안동국시의 법도다. 국시는 아무리 양을 많이 먹더라도 한나절이 지나면 배가 꺼지게 마련이다. 길 떠나는 나그네 심정을 헤아려, 국수에 조밥 한 그릇 더 주면 배가 든든해진다. 거기에 쌈 채소와 꽁치조림을 꼭 함께 내놓는다
사실 안동국시는 육수 자체가 담백하고 슴슴하기 때문에 정작 화룡점정의 국수 맛을 내는 것은 집집마다 내놓은 '간장'에 달려있다. 기성품으로 파는 간장이 아니라 집마다 다른 조선간장을 베이스로 거친게 빻은 입자의 고춧가루, 파 등을 베이스로 만들어내는 숙성 '간장'이 그것이다.
밀가루가 귀했던 조선시대 국수는 양반집이 아니면 구경할 수도 없는 귀한 음식이었다. 지체높은 양반가들이 제사를 지낸 날, 안동국시 한 그릇 얻어먹으면 귀한 음식 먹었다고 자랑하곤 했다.
중국 누들로드의 시발점인 산시(山西)지방에서 국수문화가 꽃을 피운 것은 국수가 서민음식이었기 때문이다. 국수는 탄광에 들어가는 광부들이 빨리 먹을 수 있는 최적의 음식이었고 빨리 끓일 수 있는 화력의 석탄이 있었기에 국수문화가 산시에서 활짝 필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수가 각광받기 시작한 것은 6.25전쟁직후 구휼물자로 미국산 밀가루가 대량으로 들어오면서 국수공장이 우후죽순으로 생긴 후부터였을 것이다. 공장에서 대량으로 뽑아낸 제면국수가 만들어 낸 '구포국수'와 '구룡포국수'는 단숨에 온 국민을 배고픔에서 구출해 낸 '구휼식품'으로 자리 잡았다.

그 국수들이 서민들의 희노애락을 달래주는 '잔치국수'였다.
'안동국시'는 그런 대량제면 시대를 거쳐 다시 직접 반죽을 하고 면발을 썰어내는 아날로그 감성을 자아내는 국수를 대표한다. 청와대에 칼국수를 도입한 한 전직 대통령이 사랑한 국수도 안동국시였다.
어릴 때 엄마가 해주던 그 손맛을 기억하게 하는 그리운 '엄마표 국수'. 혹은 그 옛날 양반가에서 해먹던 국수를 안동국시는 되살려내고 있다. 고향묵집, 옥동손국수, 무주무손국수 등이 유명하다.
서명수 슈퍼차이나연구소 대표
배성훈 기자 bs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