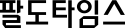70년 세월이 흘렀지만, 대구에 6·25전쟁의 상흔을 간직한 '피란민 수용소' 건물이 있다. 아직 이곳에는 '피란민 할머니'가 살고 있다.
대구 북구 칠성동 북부교회 인근 낡고 허름한 건물. 동네 사람들은 이곳을 '피란민 수용소'라고 부른다. 20여 명의 사람들이 월세 5만원짜리 9.9~26.4㎡(3~8평) 공간에서 '피란 생활'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이어가고 있다.
악취가 코를 찌르는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니 전쟁 당시 피란민들이 모여 살았던 건물 4동이 나왔다. 건물을 떠받치는 나무는 썩고, 흙으로 만든 벽은 군데군데 헐어서 무너질 지경이었다.
전쟁이 끝나고도 두 세대가 바뀌었지만, 변애자(91) 씨는 여전히 이곳에서 힘겹게 하루 하루를 버티고 있다.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난 변 씨는 해방 전 부모 손을 잡고 서울 용산까지 3일이 걸려서 이 내려왔다. 이후 남편을 만났고 경북 안동에서 가정을 꾸렸다. 하지만 남편과의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다. 변 씨는 전쟁 중이던 1952년 남편과 불화로 큰아들을 등에 업은 채 부모가 있는 칠성동 피란민수용소로 돌아왔다. 그렇게 이 동네와 인연이 이어졌다.
변 씨에 따르면 이곳은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관리했던 '뽕나무 누에 창고'였다. 해방 후 일본인들이 떠나고 빈 창고만 남았다. 그러던 곳이 전쟁 때 북에서 피란민들이 대구로 몰려오면서 '피란민 수용소'로 바뀌었다는 것. 변 씨는 "당시는 지금처럼 방 구조가 아니라 가꾸목(각목)으로 구역을 나눠 피란민들이 한 공간에서 지냈다"고 회상했다.
전등도 없는 수용소에서 피란민들은 촛불로 어둠을 밝혔다. 이 탓에 불이 자주 났다고 한다. 변 씨는 "불이 나서 가족 모두가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밖으로 뛰쳐나왔다. 다른 피란민들에 비해 우리 가족이 옷이 많았는데, 몽땅 타버려서 굉장히 속상했다"고 말했다.
각목으로 주거 구역을 정했던 피란민들은 어느새 방도 만들었다. 엉성했지만 그래도 가족만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좁은 공간에 피란민이 몰리다보니, 한 가족에게 허용된 공간은 9.9㎡ 정도. 변 씨는 "식구가 아무리 많더라도 3평 안에서 부대끼며 생활해야 했다. 다락에 자다가 떨어져 다친 이웃도 있었다"고 했다.
피란민들은 서로 배려했지만, 먹고사는 문제만큼은 냉정했다. 매일 수수로 끼니를 때우던 시절이라서 이웃이 하루 굶는다고 음식을 나누는 일은 없었다. 변 씨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장사를 시작했다.
"참기름과 군복 장사를 했지요. 그렇게 번 돈으로 이불이나 생필품들을 샀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교동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이 동네는 남편 없이는 살아도 시장 없으면 못 산다'는 말이 돌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장사가 잘 됐지요."
불화로 헤어졌던 변 씨의 남편이 24년 만에 대구에 왔다. 우여곡절 끝에 결혼생활은 이어졌고, 중구 봉산동으로 이사를 갔다. 하지만 남편은 매일 술에 취한 채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 결국 남편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혼자된 변 씨는 1989년 피란민 수용소를 다시 찾았다. 37년 전 가족과 함께 들어와 살았던 이곳에 이제 변 씨 혼자 살게 됐다. 많은 시간이 흘렀으나 이곳의 모습은 바뀐 게 없었다. 여전히 보일러가 아닌 석탄으로 겨울을 버텨야 했고, 여름이면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악취를 견뎌야 했다.
변 씨는 인근 교회에 마음을 의지했다. 교회생활을 통해 이웃과도 가까워졌다. 그런 가운데 9년 전 어느 날 황해도에서 내려온 한 이웃이 새벽 예배에 나오지 않았다.
변 씨는 "집 안이 조용해 '자나 보다' 생각했지만, 계속 인기척이 없어 문을 열어보니 혼자 죽어 있었다. 같은 이북사람이라 가깝게만 지냈는데 보낼 수밖에 없어 가슴이 먹먹했다"고 말했다.
이곳에서 아들마저 사고로 잃었다. 변 씨는 "2000년대 초 이 동네 인근에 중고가전거리가 형성되면서 활기를 띠었다. 가전들이 상점 앞에 쌓였고 인도와 차도를 뒤덮었다. 하루는 아들이 내가 사는 곳에 왔다가 길을 건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도로 위 가전들에 가려 미쳐 차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고 했다.
변 씨는 희미해져가는 기억들을 기자에게 들려주며 손으로 눈언저리를 자주 훔쳤다.
임재환 기자 rehwan@imaeil.com